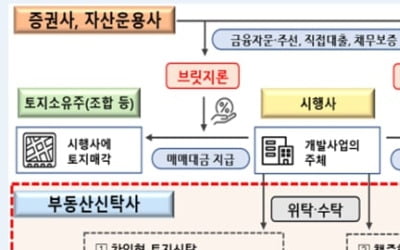입력2006.04.02 16:53
수정2006.04.02 16:56
신한은행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다.
산파역을 맡았던 이희건 전 신한은행 회장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다.
2차 오일쇼크 등으로 한국의 외환사정이 극도로 어려웠던 1982년, 일본 오사카상은(商銀) 이사장이던 이 전 회장은 일본에서 교포자금을 끌어와 신한은행을 설립했다.
당시 교포들은 신한은행 설립자금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국내로 수송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신한은행 출범후에도 주주들을 설득해 10년 동안 배당을 받지 않고 이익금을 내부유보케 하는 등 신한은행이 고속성장의 기반을 닦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작년 2월까지 18년여 동안 신한은행 회장직을 맡으며 은행이 외풍(外風)을 타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도 했다.
이런 이 전 회장과 라 회장의 인연은 신한은행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은행 비서실장이던 라 회장은 김준성 행장(이후 부총리 역임)을 수행해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이 회장과 처음 만났다.
이 회장은 77년 제일투자금융을 설립할 때 김 전 부총리의 천거를 받아 라 회장을 이사로 영입했고 이후 라 회장은 신한은행 창립멤버가 됐다.
고졸(선린상고) 출신으로 은행장까지 오른 라 회장은 철저한 소신 경영으로 신한은행을 일궜다.
정치권이나 정부관료들의 대출청탁을 거절, 한보 부실채권을 최소화한 것 등은 금융계의 유명한 일화중 하나다.
이같은 소신경영 덕분에 그는 은행장으로선 처음 3연임하는 기록도 남겼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