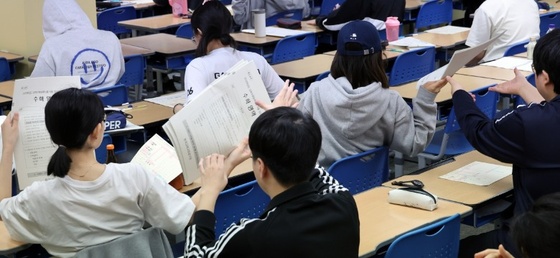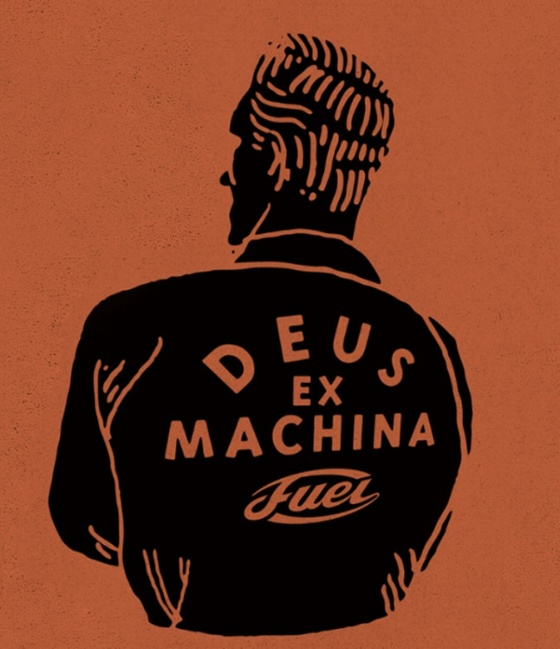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2050년 탄소중립 달성' 사실상 실패…G20 합의문서 빠졌다
정상들 "21세기 중반까지 달성"
정확한 목표시한은 설정 못해
中·인도 비협조적 태도가 발목
개도국에 年 1000억달러 지원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은 중단
‘1.5도 이내 제한’ 합의했지만
31일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들이 전날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선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 가능하다면 1.5도 아래로 억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6년 전보다 한발 더 나아간 합의를 이룬 것이다. G20 공동선언문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2025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과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OP26에서 반전 이룰까
G20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COP26에 앞서 각국의 견해차를 조율할 기회였다. G20 회원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80%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는 COP26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짓는 시험대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안 도출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이번 회의가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시작 전부터 나왔다. 전날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COP26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COP26이 성공할 확률은 60%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7월 G20 환경부 장관들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석탄 퇴출 시기를 정하는 데 실패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반발이 탄소중립 시기를 구체화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으로 적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기존대로 목표 시점을 2060년을 제시했다. 전력난에 빠진 중국은 최근 석탄 수입을 늘리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COP26에 불참한다.
인도는 탄소중립 계획조차 내놓지 않았다. R P 굽타 인도 환경부 장관은 “인도는 지구 온난화의 가해국이 아니라 피해국”이라며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를 선진국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OP26 결과를 비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BBC 방송은 한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G20 정상회의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 인터뷰에서 “COP26의 결과는 아직 모른다”며 “2015년 파리협약에서도 사전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구인구직 800만건대 초반으로 급감…노동시장 냉각 [속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