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은 비리 '온상'…불공정 거래 대부분 발생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내 불공정 거래 혐의 건수는 59건으로 전년의 103건에 비해 42.7%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213건으로 4.9% 늘었다. 또 파상생품 불공정 거래 혐의는 2009년 2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144.4%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31.6%를 차지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69건의 혐의가 나와 유가증권시장(17건)의 혐의 발생 건수를 압도했다.
이용된 미공개정보로는 감자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변동 13건, 경영권 변동 11건, 횡령ㆍ배임 9건, 감사의견 거절 8건 순이었다.
최근 몇 해 동안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강화되면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56건)가 호재성 정보(30건)를 이용한 사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미공개 정보로 인해 생긴 부당이득은 종목별로 평균 14억300만원이었다. 부당이득금이 10억원을 넘은 종목도 30건에 달했다.
이런 유형의 부당거래 혐의는 주로 최대주주가 개인이고 지분이 20% 미만인 종목에서 내부자에 의해 발생했다. 경영권 변동이 자주 있거나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자주 악용한다는 얘기다.
시세조종 혐의가 발생한 건수는 전체 불공정거래의 28%인 76건을 기록했다. 유가증권ㆍ코스닥을 합한 기록이다. 특히 파생상품의 시세조종 혐의가 두드러졌다. 2009년에는 2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엔 64건까지 늘었다.
시세조종은 대량의 허수성 호가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이 많았다. 또 소형주를 매집해 주가를 띄운 후 고가의 분할 가장매매를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 단기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수법도 있었다.
시세조종 종목들은 이유 없이 거래량이 늘고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메뚜기형' 단타성 매매 등 단기 시세조종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세조종은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주문을 내거나 사이버 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주문 지역을 분산하거나 입출금 내역을 소액으로 분산해 자금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지능적인 행태도 보인다.
시세조종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액은 종목당 평균 12억1200만원이었다.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종목별 평균 위탁자수는 30명이었고, 50명을 넘는 경우도 13건이 있었다.
불공정거래 중 자본잠식 탈피 목적으로 애널리스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소액주주 운동을 빙자해 전문화된 조직을 동원하는 부정거래 혐의도 지난해 14건이나 발생했다.
부정거래는 대부분 호재성 허위 정보를 시장에 흘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한 뒤 자신들은 주식을 파는 식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큰 종목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동조사 등을 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고, 그 수법이 더욱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종목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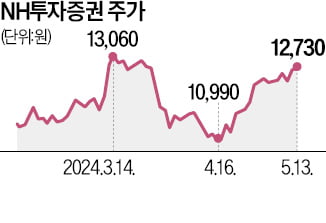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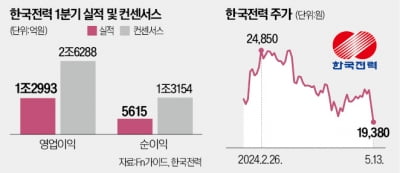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그의 그림 속 인물은 설명되지 않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9952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