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49
수정2006.04.02 18:52
'억대 샐러리맨.'
증권업계는 다른 업계보다도 이런 표현이 낯설지 않은 분야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시장은 자신의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나이 경력에 상관없이 연간 수억원의 거금을 챙길 수 있는 '실적급 연봉제'가 가장 잘 정착된 업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와 투자 자금을 직접 굴리는 펀드매니저는 대표적인 전문직종 종사자로 평가받으면서 고액연봉의 대표주자로 통한다.
증시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일컬어지는 이들도 처음 입문단계에선 연봉 5천만원 이하에서 시작하는 보통 샐러리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실력을 인정받고 유명세만 타게 되면 웬만한 샐러리맨은 꿈꾸기 어려운 수억원대의 연봉을 거머쥘 수 있는 핵심 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최근 급부각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30대 초반의 연령층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제 5년차인데도 벌써 '억'자가 붙어다니는 것으로 안다"며 "젊은 나이와 길지 않은 경력 등 기존의 잣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세계에선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애널리스트 몸값이 크게 뛴 것은 국내외 증권사들이 영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리서치분야를 앞다퉈 강화하는데서 비롯됐다.
리서치업무를 담당할 애널리스트의 공급은 제한적인데 반해 수요는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잘 나가는 주요 업종을 맡고 있으면 연봉 3억원, 영어구사가 가능하면 5억원선이 기본'이라는 말이 증권가에 공공연히 나도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증권사의 기업분석업무를 총괄지휘하는 리서치센터장의 경우는 연봉 단위가 더 올라간다.
시장에서 웬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이들의 연봉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업종별 애널리스트보다 연봉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한 경력이 더해져 국제적으로도 알려진 리서치센터장의 봉투는 더 두툼해진다.
외국계의 경우엔 굳이 센터장급이 아니더라도 주요 업종 애널리스트 연봉이 연간 수십~수백만달러를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모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둘러싼 스카우트 경쟁속에서 무려 3백만달러까지 몸값이 치솟았다는 루머도 나돌았었다.
국내에서 애널리스트 억대 연봉시대를 연 것은 현대증권이었다.
지난 99년 현대증권은 '바이코리아(한국 주식을 사자)'를 모토로 분야별 최고 애널리스트 스카우트에 나섰었다.
그 당시 정태욱 센터장와 조병문 임정훈씨 등 스타급 애널리스트들이 거액 연봉을 받고 자리를 옮겨 왔다.
올들어 애널리스트 몸값의 '2차 급등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증권사들이 신한지주의 굿모닝증권 인수로 시작된 금융 증권업계 재편 움직임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기존 수익구조에서의 과감한 탈피 등 급변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리서치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투신운용 투자자문사들이 애널리스트 스카우트 경쟁에 뛰어들면서 인력유치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실력있는 펀드매니저도 애널리스트 못지않은 고액연봉을 받는다.
초봉은 대개 4천만~5천만원대이지만 경력이 붙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얻으면 손에 쥐는 소득이 커지게 마련이다.
일부 스타급의 연봉은 수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기대 이상의 높은 운용실적을 기록하면 그중 일부를 인센티브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보너스로만 수십억원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식 채권 선물 등 각 분야의 브로커 중에서도 연간 억대 소득을 거머쥐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래 수수료를 먹고사는 이들의 소득은 실적에 따른 크게 달라진다는게 흠이라면 흠이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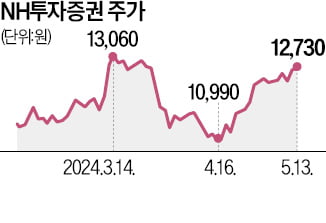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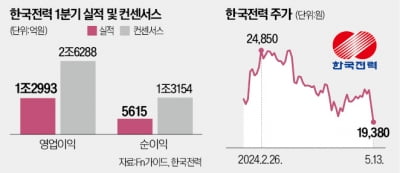











![[오늘의 arte] 예술인 QUIZ : 그의 그림 속 인물은 설명되지 않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69952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