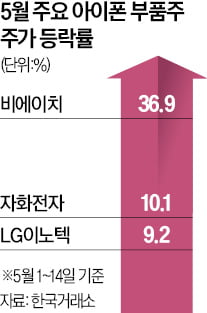[취재여록] 증권제도 개혁
말그대로 증권 제도의 대폭발.
그러나 이 빅뱅에는 뚜렷한 철학과 분명한 수단이 내재되어 있었다.
뉴욕증시에 빼앗긴 명예를 되찾겠다는 목표와 이를 위해 수수료 인하 등
완벽한 투자자 보호제도를 구축한다는 수단의 조화.
10년이 지난 96년.
한국정부는 유례 없는 증권 비리 사건을 뒤로 하고 증권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과연 어떤 철학과 수단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이 복잡한 "대책"들을
관전하는 포인트다.
소감은 한마디로 구태의 답습이요 투자자 보호의 실종이다.
우선 기업 공개요건을 "세계 최우량 기업수준"으로 높여 놓은 것은
증권비리에 대한 일종의 급조된 복수극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할테면 해봐라는 식의 치솟은 공개 기준은
자율이라는 이름을 내건 당국의 횡포라 할 것이다.
더욱이 이 공개 기준에서 국영기업과 공기업을 제외시킨다는 발상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시장 그자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대원칙이다.
공기업 주식 매각 등 정부가 직접 쏟아내는 물량이 증시 침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도 정부는 애써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 남는 대책은 신용거래 확대 등 투기적 가수요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정책의 실패가 될 것이 뻔하다.
수수료 인하를 장기과제로만 슬쩍 걸쳐놓은 부분은 정부가 업자들의
담합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높은 회전율에 고율의 수수료는 그동안에도 투자자를 빈곤화시키는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해왔다.
"대책"작성을 업자들의 모임(협회)에 맡겼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결국 기관투자가 육성 등 진정한 자율화대책은 이번에도 실종이다.
증권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우리의 관료조직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될 것이고.
정규재 < 증권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