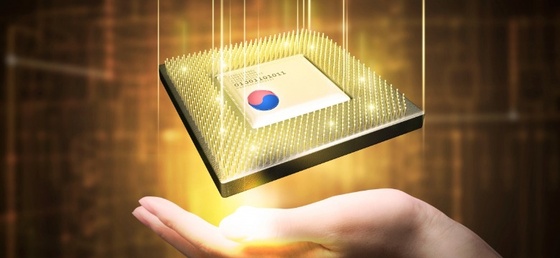좌우를 한통속으로 밀어넣어준 정치 질서가 사라졌다 [서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게리 거스틀 지음
홍기빈 옮김/arte
680쪽|4만원
뉴딜 정책 이어갔던 아이젠하워
신자유주의 정책 폈던 클린턴
좌우를 아울렀던 정치 질서가 사라졌다

지금은 아니다. 혼란의 시대다. 기술과 세계 정세가 급변한 탓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지배적인 정치 질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뉴딜과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바다. 책을 쓴 게리 거스틀은 미국 역사학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미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1989년 <뉴딜 질서의 흥망 1930-1980>을 동료와 함께 썼다. 이 책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한 후속작이 <뉴딜과 신자유주의>다.
![좌우를 한통속으로 밀어넣어준 정치 질서가 사라졌다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20748.1.jpg)
정치 질서의 독특한 점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당대의 정치 질서에 얽매여 정책을 펴게 된다는 점이다. 뉴딜 질서는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힘을 얻기 시작했지만, 공화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도 지배적인 정치 질서였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8년 동안 재임한 아이젠하워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케인스주의에 따라 재정 정책을 폈다. 노조에도 우호적이었다.
정부의 중요성을 아는 군인 출신인 까닭도 있지만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공산주의가 ‘다 같이 잘 살자’는 말로 사람들을 회유하던 때였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일지라도 정부가 뒤로 물러선 채 개인이 능력껏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뉴딜 질서의 몰락에는 내부 모순과 한계, 공산주의 쇠퇴가 영향을 미쳤다. 때를 기다리며 이념을 갈고 닦던 보수 이론가들 덕분에 신자유주의는 금방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도 좌·우 진영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 질서 하에서 움직였다. 신자유주의가 정점을 찍었던 것이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 때였다. 클린턴은 자유무역을 추구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서명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지지했다.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합병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초거대 은행들이 탄생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다음 정권인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균열이 일어났다. 이라크 전쟁을 벌이며 국력을 낭비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저자는 ‘기고만장’이란 말로 이 시기를 표현한다. 책은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도 신자유주의 질서 아래 움직였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은 이 질서의 몰락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지배적인 정치 질서가 사라진 시대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흐른다. 좌·우 진영을 묶어주는 끈이 사라진 탓이다. 각 진영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 정치에 철학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단순히 표를 위해 포퓰리즘을 좇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정치 질서가 수립되기까지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사를 다룬 책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실마리를 제공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뉴딜 질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복지에 힘쓴 것 등이 그런 예다.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진영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도 했다.
기본적으로 역사책이다. 어려운 정치 이론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서술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그림으로, 화가로, 단편으로… '100주기' 카프카 다룬 책들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18376.3.jpg)
![출산율 0.65명 시대에 누가 일을 하냐고? 고학력 고령인구가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19144.3.jpg)
![새벽에 전투기 몰고 전투, 오후엔 출근한 이스라엘 예비군 [서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726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