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툭튀' 또 노동법원…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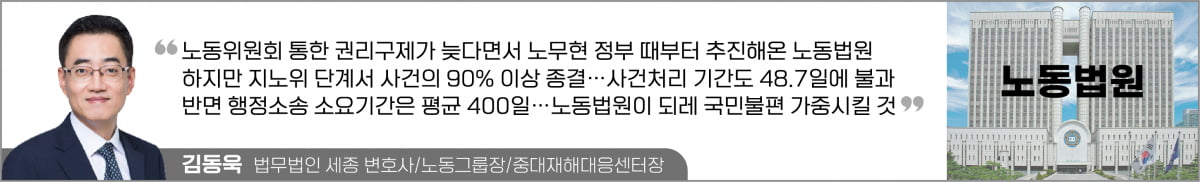
노동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2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였으나, 로스쿨과 달리 도입되지 못했다. 노동법원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뚜렷하다. 노동법원을 통한 노동사건 처리가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원의 기능적 측면에서 핵심 쟁점은 노동법원이 노동위원회와 비교하여 더 우월한 사회적 기능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다. 노동법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위원회가 사회적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늦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노동위원회가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담당해내고 있고, 비판론자들의 비판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늦다면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소위 '8심제'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거쳐 최대 8심까지 가야 종결이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한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비판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1,2,3심)을 거쳐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이론상 그럴 뿐이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구제명령을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더 나아가 행정소송 종결 후에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물다.
2022년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1만4159건인데, 지노위가 1만2224건을 처리했고, 중노위가 1934건을 처리했다. 지노위 판정이 중노위에 재심신청되는 확률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건수는 548건으로서 지노위에 접수되는 사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90% 정도의 사건이 지노위 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다. 한편, 지노위의 사건처리 일수는 평균 48.7일에 불과하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90%에 이르는 사건들이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2022년 기준 401일에 달한다. 지노위의 평균 처리기간이 1심 재판에 비해 8.4배 이상 빠른 것이다. 중노위에 재심신청된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지노위 사건처리 기간을 포함)은 132일 정도이며, 1심 재판에 비하여 3배 정도 빠르다.
이처럼 대다수의 노동위원회 사건이 법원의 재판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거쳐 종국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행정소송 단계부터 권리구제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노동사건 처리절차를 법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경우 오히려 전체 노동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법원의 재판절차는 그 속성상 노동위원회와 같은 행정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거쳐 8심에 이르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과연 그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추정컨대,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필자는 노동위원회에 4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4년 동안 그러한 경우를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법원을 통한 구제보다 지연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다.
노동법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동위윈회가 행정기관에 불과하여, 재판과 같이 사법(私法)적인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변동시키지 못한다는 점도 비판한다.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노동위윈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권리의무만을 명할 뿐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사변적인 주장이다. 노동사건 처리절차의 수요자인 국민들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공법적인 것인지, 사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자신의 사건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쥐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쥐를 잡은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인지 흰 고양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대부분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된다는 것은 구제절차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제도는 외국에서도 밴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의 중심에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우수한 제도를 폐지하면서까지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노동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를 늦추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노동법원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노동그룹장/중대재해대응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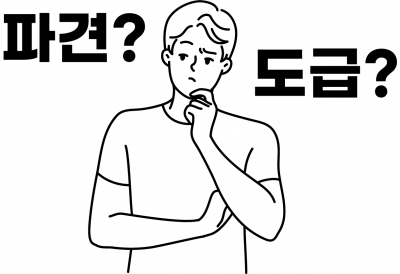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