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파산신청' 남발에 멈춰선 코스닥 상장사…제도 악용하는 세력 등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켓PRO] '파산신청' 남발에 멈춰선 코스닥 상장사…제도 악용하는 세력 등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135834.1.jpg)
파산신청 남발, 상장사 경영진·소액주주 울려
주식 한 주만 있더라도 채권자 주장…경영진 압박
회생법원에 파산신청 시 상장사는 거래정지
김앤전 법무법인, 파산신청 소송 대리인 자주 등장
한국거래소도 못 잡아내는 수상한 파산신청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코스닥 바이오업체 스피어파워의 채권자라고 주장한 성지피에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스피어파워가 추진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에 배제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파산신청서 접수가 확인되자 주식 매매는 하루 간 정지됐다. 스피어파워는 성지피에스와 어떠한 금전거래나 사업적 거래가 없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 파산신청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파산신청은 회생법원에서 기각됐다.
상장사 경영진이나 소액주주들이 수상한 파산신청에 울상 짓는 사례가 잇따른다. 코스닥 생활용품제조사 에이치앤비디자인은 지난해 11월 파산신청을 당한 뒤 법원에서 기각됐다.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뉴지랩파마도 같은해 2월과 3월 파산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외에도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과 시장에서 퇴출된 멜파스 등이 파산신청 접수에 따른 주식 거래 매매 정지 사태를 겪었다.
시장에선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파산신청 악용' 세력이 등장했단 이야기까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상장사의 파산신청 소송에서 법무법인 김앤전(대표 변호사 전병우)이 대리인으로 자주 등장했다. 에이치앤비디자인 파산신청의 경우 전병우 대표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에스제이엔비폴이 직접 회생법원에 접수했다. 일부 상장사들은 김앤전에 따른 피해 대응 협력 등의 자료를 문서화해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상장 기업의 파산신청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한국거래소는 파산설이 불거진 상장사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이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식의 매매를 정지시킨다. 거래 정지는 상장사 경영진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된다. 소액주주들은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사태에 당황해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파산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은 상장사 경영진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사적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회사가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파산신청 악용 사례를 걸러내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거래소는 과거 파산설 불거지면 기계적으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던 규정을, 심리와 확인 등을 통한 조치로 바꿨다. 파산설이 불거진 기업에 거래정지 조치 전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단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파산신청을 당한 상장사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파산신청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예외조항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거래소는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 20억원 미만, 채권액 전액 법원에 공탁 확인 등을 거래정지 조치 예외조항으로 뒀으나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할 때 채권액수는 필수 확인 사항이 아니다. 즉 주식 한 주만 보유하더라도 채권자라 주장하며 법원에 파산신청이 가능하단 의미다.
결국 상장 기업의 경영진이나 소액주주들이 악의적인 파산신청 여부를 직접 파악해야 한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는 "파산신청은 회생과 달리 신청권자인 채권자의 채권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신청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는 심문 과정에서 밝혀진다"면서 "따라서 극히 소액의 채권자도 상장사 경영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등 파산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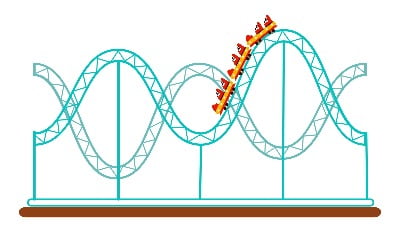
![[마켓칼럼] 지금은 '주식시장의 4국면' 중 어디에 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48545.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