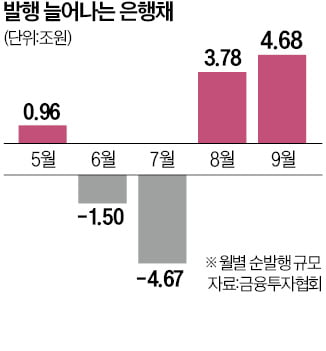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예금보호 한도 상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끝에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금보호 제도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미국 사례 등을 보면 한도를 상향해도 뱅크런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기 시에는 한도 상향보다 전액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고 부담은 모든 금융 소비자가 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예금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로,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99.3%가 돼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 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호 한도 인상 시 최대 27.3%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회사의 늘어난 예금보험료는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소형 저축은행의 자금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위는 “보호 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 업권 내 소형사에서 대형사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