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노동법도 견디기 힘든 요소다. 중국의 근로계약법은 고용계약 형태를 크게 1~3년 단위의 고정기한제, 무기한제, 일정 업무 완성기한제 등 세 가지로 나눈다. 근로자가 같은 기업에서 만 10년을 연속 근무한 경우, 2회 연속 고정기한 근로계약을 마치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엔 무기한제가 된다. 문제는 이때부터 갑을관계가 바뀐다는 것. 대충 일해도 자르기 힘들고, 퇴직금도 다른 직원보다 훨씬 많이 줘야 한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는 광범위하다. 높은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나 급격한 정책 변화로 겪는 위험뿐만이 아니다. 요소수 사태로 경험했듯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은 한국으로선 언제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험한 외교·안보 리스크도 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중국의 정치·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도 공산당이 모든 걸 쥐락펴락한다. 언제라도 안면몰수하고 강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사회주의 중국이다.
글로벌 기업의 탈(脫)중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접으려고 해도 지방정부의 뜻밖 규제에 가로막혀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런저런 규제를 들이대 떠나는 기업을 ‘탈탈’ 터는 경우가 많고 기업 간 협상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인수 적격 기업 리스트까지 제시한다니 허가받은 깡패나 다름없다. 이러니 떠나려는 기업이 더 늘 수밖에.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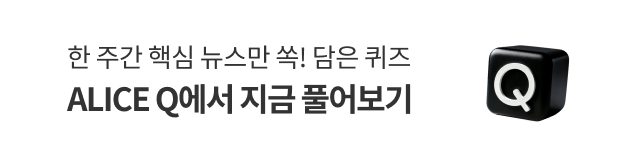
![[천자칼럼] 한·일 관계의 '슬램덩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316629.3.jpg)
![[천자칼럼] 고향사랑 기부 경쟁](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304973.3.jpg)
![[천자칼럼] TPO 안 맞는 공직자의 눈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A.3229514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