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은행원이 사기 가담했다면 시효 지나도 금융사가 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재판 포커스
은행 직원이 연루된 사기 범죄로 예금주가 맡겨둔 돈을 잃었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은행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모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병원의 직원 B씨는 2011년 금융회사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A씨의 예탁금 57억여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B씨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금융회사 직원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께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 57억여원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예금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이유였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부분은 4000만원 정도의 이자뿐이었다. 하급심은 또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A씨가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금융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 탓이 아니라고 보고 금융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B씨의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A씨의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범행에 가담한 금융회사 직원들도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 권리 보전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로 따질 문제일 뿐”이라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아예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모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병원의 직원 B씨는 2011년 금융회사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A씨의 예탁금 57억여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B씨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금융회사 직원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께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 57억여원과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예금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이유였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부분은 4000만원 정도의 이자뿐이었다. 하급심은 또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A씨가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금융회사 직원의 불법 행위 탓이 아니라고 보고 금융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B씨의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A씨의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는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범행에 가담한 금융회사 직원들도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등 권리 보전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로 따질 문제일 뿐”이라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아예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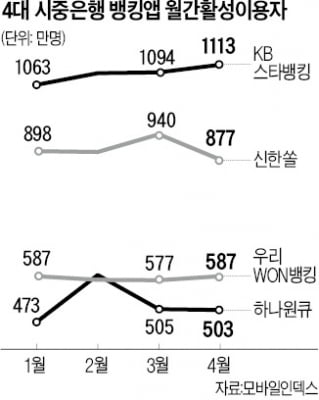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