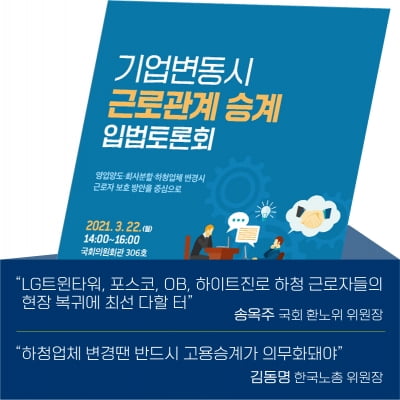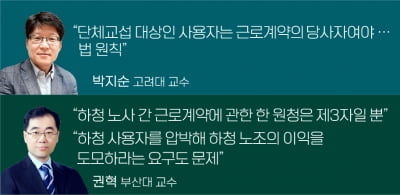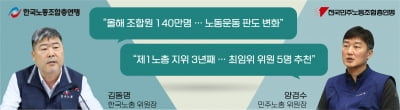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벽배송업체 마켓컬리에 이어 종합여가 플랫폼기업 야놀자가 미국 상장 계획을 밝혔다. 두 회사 모두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공한 기업이지만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나 쿠팡이 상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쿠팡은 올 초 기업가치가 30조원 대로 예상됐으나 상장 직전 55조원으로 불어나더니 상장 직전에는 68조원으로 인정받았다. 공모가는 당초 제시했던 32~34달러 보다 높은 35달러.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까지 치솟았다.
쿠팡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유니콘들은 미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매각설과 기업공개(IPO)설을 재차 부인했던 마켓컬리는 쿠팡이 상장한 다음 날 미국 상장을 공식화했다. 국내 상장 주관사였던 삼성증권과 계약도 해지했다. 최근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간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골드만삭스 출신인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와 모건스탠리 출신의 김종훈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일사천리로 상장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야놀자도 미국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고 상반기 중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고 했으나 국내와 미국 상장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다수의 글로벌 증권사들이 야놀자 측에 해외 상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상장시 기업가치를 5조원 이상 받기 어렵다는 점도 회사 측의 마음을 움직인 요인이다. 국내 유니콘 기업 중 조 단위 기업가치로 상장한 전례가 없다.
야놀자 역시 해외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지난 달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최찬석 전 넷마블 투자전략실 상무를 영입했고 조만간 해외 증권사를 주관사로 추가할 예정이다. 창업자인 이수진 대표를 비롯해 맥킨지 출신 김종윤 최고사업책임자(CBO)와 PwC 출신 배보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해외 상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외에도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 등이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쿠팡처럼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회사도 성공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은 기업은 더욱 유리하다는 점에서다.
IB 업계는 예비상장사들이 해외 증시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시장에 상장할 경우 최대 10배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쿠팡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은 기업들은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미국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초 성장형 기업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코스닥 특례 상장 기업들은 오히려 상장 요건이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소극적인 혜택으로는 경쟁력 있는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며 "쿠팡처럼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라면 높은 기업가치로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