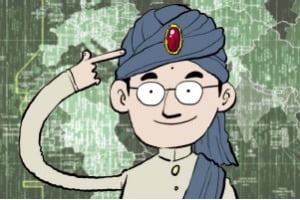
인도계 CEO는 글로벌 IT업계를 휩쓸고 있다. 2014년부터 MS의 부흥을 주도해온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알파벳 최고경영자까지 겸하고 있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13년째 어도비 CEO로 재임 중인 산타누 나라옌 등 거물들이 즐비하다. 이들은 ‘인도의 매사추세츠공대(MIT)’로 불리는 인도공대(IIT) 등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미국 명문대에서 컴퓨터 관련 학위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성공 비결로 인도인 특유의 기업가 정신인 ‘주가드(Jugaad)’를 꼽는다. 힌두어로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뜻하는 주가드는 열악한 환경에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고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경영기법이다. 이들은 14억 인구를 아우르는 다양성과 포용성, 신뢰의 리더십, 제1공용어인 영어 능력까지 겸비했다.
이런 요인을 ‘트리플 A’로 설명하기도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인도공대 출신 판카즈 아가르왈 대표는 “인도 특유의 적응력(adaptability)과 강력한 추진력(action-oriented), 끝없는 도전정신(always hungry)이 그것”이라고 말한다. 구글 입사 11년 만에 CEO가 된 피차이, MS 입사 22년 만에 최고 자리에 오른 나델라 등이 이런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한다.
또 다른 비결은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민 1세대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IT 인재 양성에 앞장서면서 이들의 미국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후 인텔에서 USB를 개발한 아제이 바트,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공동창업자 비노드 코슬라 등은 자신들의 노하우와 인맥, 돈으로 2세대를 돕고 있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30%가 인도계다.
미국 내 인도계 인구는 200여 만 명으로 한인 숫자와 비슷하다. 세계적으로 ‘머리 좋고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파워’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날은 언제쯤일까.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천자 칼럼] '올드 랭 사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625158.3.jpg)
![[천자 칼럼] 병 주고 약 주는 박쥐](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613876.3.jpg)
![[천자 칼럼] '한우물'의 힘](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59986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