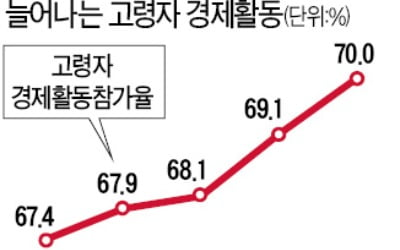학생 200만명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10년간 81%↑…나랏돈 씀씀이 구조조정 시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칸막이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
55조 넘어…퍼주기 실탄으로 남용
55조 넘어…퍼주기 실탄으로 남용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해 ‘나랏돈 씀씀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내국세의 20.46%만큼을 무조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 시설이 열악했던 1971년 도입한 이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난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가 초·중·고교에 들어간 1970년대엔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고 열악한 학사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칸막이 예산’이 필요했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는 현시점에는 예산 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는 칸막이 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 숫자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55조2488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30조4279억원)에 비해 81.4%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745만 명에서 545만 명으로 26.8% 감소했다. 예산이 ‘수요’(학생 수)가 아니라 ‘세금수입’에 연동된 데다 다른 곳으로 돌려쓸 수도 없어 이해하기 힘든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된다. 정부는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65조9000여억원)이 올해보다 25.9% 늘지만 반대로 초·중·고교생 수(530만 명)는 1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한 교육교부금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각 교육청은 두둑해진 지갑으로 ‘퍼주기 복지’에 나서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7조3360억원으로 2016년(3조8228억원)보다 91.9% 늘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교과서 및 급식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성태윤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대표적인 게 내국세의 20.46%만큼을 무조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교육 시설이 열악했던 1971년 도입한 이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난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가 초·중·고교에 들어간 1970년대엔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고 열악한 학사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칸막이 예산’이 필요했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는 현시점에는 예산 낭비를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없는 칸막이 예산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 숫자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55조2488억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30조4279억원)에 비해 81.4%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745만 명에서 545만 명으로 26.8% 감소했다. 예산이 ‘수요’(학생 수)가 아니라 ‘세금수입’에 연동된 데다 다른 곳으로 돌려쓸 수도 없어 이해하기 힘든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된다. 정부는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65조9000여억원)이 올해보다 25.9% 늘지만 반대로 초·중·고교생 수(530만 명)는 1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한 교육교부금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각 교육청은 두둑해진 지갑으로 ‘퍼주기 복지’에 나서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7조3360억원으로 2016년(3조8228억원)보다 91.9% 늘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교과서 및 급식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성태윤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