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현의 문화살롱] 곤충학자를 꿈꿨던 화가 고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두현 논설위원
![[고두현의 문화살롱] 곤충학자를 꿈꿨던 화가 고흐](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07.14250991.1.jpg)
고흐의 관찰력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그는 아침부터 들판에 나가 온갖 곤충들을 지켜봤다. 몇 시간씩 개울 둑에 앉아 물방개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곤충들을 과학자처럼 찬찬히 관찰하면서 이를 꼼꼼하게 분류했다. 벌레들의 이름도 다 외웠다.
관찰은 성찰과 통찰의 어머니
당시 그의 꿈은 파브르 같은 곤충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작고 하찮은 생명체의 움직임에 푹 빠져 꿈틀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감각을 곧추세웠다. 어떤 날은 새를 관찰하느라 종일 굶었다. 그 덕분에 철새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 과정에서 눈과 귀가 트였다.
이런 ‘관찰의 힘’이 고흐의 예술을 키운 원동력이었다. 관찰(觀察)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이다. 이는 육안과 외부 세계의 만남을 뜻한다. 자세히 살피는 과정은 눈앞의 ‘볼 견(見)’을 넘어 입체적으로 현상을 투시하는 ‘볼 시(視)’와 ‘볼 관(觀)’의 단계로 나아간다.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성찰(省察)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洞察)의 문이 열린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글자가 ‘살필 찰(察)’이다. 고흐는 ‘두루 살펴 자세히 아는 능력’을 어릴 적 곤충에서 이미 체득했다.
그의 관찰력은 곤충을 넘어 사람에게 적용됐다. 고향 네덜란드에서 작업할 때 그는 농민과 노동자 등 하층민의 생활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이 주로 먹는 감자에도 주목했다. 그때 그린 작품이 ‘감자 바구니’ ‘감자와 나막신’ ‘감자 껍질을 벗기는 시엔’ 등이다.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하기 위해 40편이 넘는 습작을 그렸다.
인물화를 그리고 싶을 때는 모델을 살 돈이 없어 거울을 보며 자화상으로 연습했다. 스스로 관찰·성찰·통찰의 매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27세에 ‘늦깎이 화가’로 출발해 3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0년 동안 2000여 점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애플·이케아 성공도 '관찰의 힘'
고흐뿐만 아니라 다른 화가들도 관찰에 몰두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물을 그릴 때 비슷한 특징을 지닌 사람이 모인 장소를 찾아다니며 습관과 외모,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뒤 붓을 들었다. 파블로 피카소도 소년 시절 비둘기의 발만 300회 이상 관찰하며 스케치했다. 그의 ‘황소’ 연작은 소를 1개월 동안 꾸준히 지켜보고 이미지를 단순화한 걸작이다.
이들의 관찰력은 현대의 기업 경영에도 활용됐다.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창업자는 고흐 방식의 관찰력 덕분에 부피가 큰 가구를 조립분해하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에 피카소 방식의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해 성공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관찰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다.
미국 철학자 존 버로스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으면 어제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라”고 권했다. 관찰은 발견을 낳고 발견은 영감을 낳는다. 똑같은 별을 보고 누구는 어둠을 떠올리고 누구는 우주로 향한 창을 상상한다. 다음주 ‘생일 주간’을 맞는 고흐도 생전에 밤하늘을 보며 “별들의 풍경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고 말했다.
kdh@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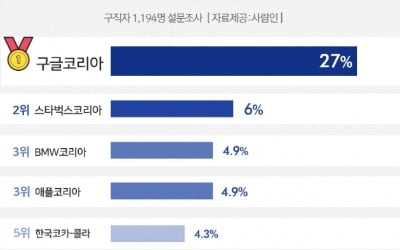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