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규 칼럼] '심판의 위기'가 경제위기 부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낡은 '無用지식'으로 간섭
법 위에 정서법, 판정번복 不信도
기업의욕 상실, 환란보다 큰 위기"
오형규 논설위원
법 위에 정서법, 판정번복 不信도
기업의욕 상실, 환란보다 큰 위기"
오형규 논설위원
![[오형규 칼럼] '심판의 위기'가 경제위기 부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7.14213005.1.jpg)
경제도 다를 게 없다.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더 나은 삶, 더 큰 이윤을 추구할 때 경제활력이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반칙·불법을 솎아내는 심판역할은 국가의 몫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심판이 아무 때나 호각을 불고, 편파 판정을 하고, 심지어 직접 감독·선수로 나서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부든 경제를 잘 아는 것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는 것은 이미 낡아 쓸모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무용(無用)지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도체와 ‘한류’처럼 정부가 모를 때 성공한다. 가장 빨리 변하는 시장과 기업을 가장 늦게 변하는 법·제도가 따라갈 수 없어서다.
지난 10년간 저성장이 고착화된 밑바탕에는 국가라는 심판 기능의 상실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국회 등 국가시스템이 세상 변화에 담 쌓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량한 지식으로 금지·규제에 골몰했다는 얘기다. ‘해봐서 안다’던 이명박 정부, ‘가봐서 안다’던 박근혜 정부를 거쳐, 지금은 ‘끝까지 해보면 알 것’이라는 정부다. 성장과 분배, 산업과 자영업이 함께 무너지는데 “내년이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교리’에서 한발짝도 안 움직인다.
관료조직은 시장 간섭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노조, 직능단체 등 이익집단은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요구하고, 표라면 영혼이라도 팔 정치권이 결탁해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을 강화했다. 어느덧 아무것도 혁신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법도 규제도 없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면 누굴 원망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다양한 방해를 받았다”는 한 스타트업 CEO의 말이 이런 현실을 함축한다.
중국 동남아도 열풍인 승차공유가 한국에선 시작도 전에 정부의 호각소리에 막혀버렸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도 모자라, ‘서울페이’처럼 지자체가 아예 선수로 뛰며 혁신을 원천봉쇄한다. 그러면서 무슨 창업을 권장하고, 혁신성장을 한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심판의 월권도 도를 넘었다. 처벌수단을 가진 모든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개인을 상대로 먼지를 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판정 번복까지 일어난다. 적법 판정을 받은 회계처리가 정권이 바뀌자 불법이 되는 판이다.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조차 법 위에 ‘국민정서법’을 올려놨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도 여론에 따라 고무줄이다. 법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근대 이래 번영한 국가는 재산권 보호, 계약 이행, 공정한 법집행이란 공통점이 있다. 베네치아에서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도 똑같은 재판을 받았다. 수천 년 전 구약성서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레위기 19장15절)고 했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진보했나.
한국에 대해 무수한 경제학자가 경고했듯이, 무디스는 내년 2.3% 저성장을 전망하면서 이유로 ‘정부발 불확실성’을 들었다. 민간에선 “내년에 기대할 산업이 전무하다”(현대경제연구원)고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제조업이 살아난다”고 한다. 그 인식의 괴리만큼 실망도 커진다. ‘노조할 자유’가 만개할수록 ‘기업할 자유’는 시궁창에 처박혀지고 있다.
기업이 국가에 바라는 것은 ‘공정한 심판’ 역할이다. 판정이 고무줄이고 편파적이면 관중은 떠난다.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이 의욕을 잃고, 개인들은 각자도생하려는 생각이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이 금(金) 모으기에 나설까. 임진왜란 때 들불 같던 의병이 병자호란 때는 없지 않았나.
oh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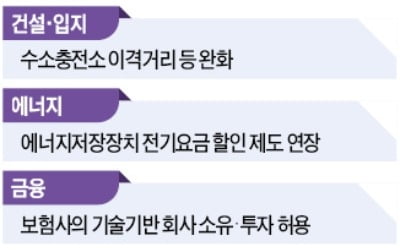
![[오형규 칼럼] 후기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7.14213005.3.jpg)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