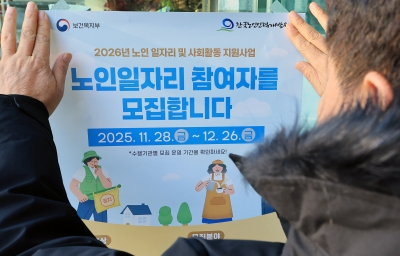기업은 전망 좋을 때 시너지 창출 적극 꾀하고
정부는 차등의결권 등 실질적 장려책 내놔야
제해진 < 프라임피이 대표 >

모두 M&A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모양만 좇고 내막의 진실에는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직후 M&A가 활성화된 건 일시적 현상이었다. 당시 국내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고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국내 기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인수 주체 가운데 국내 기업은 거의 없었다. 국내 기업들의 자생적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활성화 대책들이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주변 요소들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정책적 지원은 M&A를 활성화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세금 혜택을 보겠다고 ‘승자의 저주’를 무릅쓰고 억지로 M&A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세금 혜택 같은 게 없더라도 M&A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제대로 인식한다면 자연스럽게 M&A가 활성화될 것이다.
1998년 설립된 구글은 2001년 최초로 M&A에 나선 뒤 2017년까지 214개 회사를 인수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국내 기업들은 왜 늘어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M&A를 거의 하지 않을까.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데 성사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M&A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다. 사는 측은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측은 비싸게 팔려고 한다. 거래 진행 과정에서 이해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경험이 부족해 협상을 통해 거래를 완결하기보다 충돌이 생기면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성사되는 M&A는 매각 측이 재무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환위기 직후 M&A 거래가 많이 성사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좋은 재무자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둘째, 경쟁 업체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자기 기술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아독존식 사고를 갖고 있는 이상 다른 기업과의 M&A는 불가능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유연한 경영 사고가 필요하다.
셋째, 다른 기업과 M&A를 하면 지분이 희석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다. 이는 소탐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M&A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M&A를 하면 양자가 모두 좋아지는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다.
넷째, M&A는 기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업의 자금조달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힘들 때는 M&A를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M&A를 하더라도 매우 불리한 입장이 돼 성사되기 어렵다. 따라서 오히려 미래 전망이 좋을 때 M&A 혹은 자금조달 등 적극적인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역시 M&A밖에 없다. M&A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세금 혜택 같은 부수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M&A를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을 막고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무의결권 주식 발행 확대 그리고 양도소득세 인하 등이 대표적이다.
대신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치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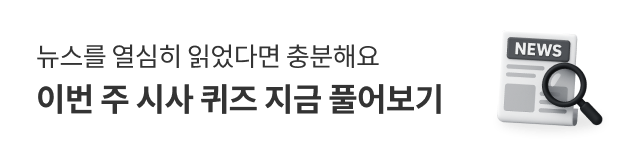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분석과 시각] 手製와 공장제의 대립, 그 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07.1436223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