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수백억 회사가 정관 바꿔… CB·BW 한도 兆단위로 늘리기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도개선 필요한 '3자 배정' 증자
한국 자본시장에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자금조달은 원래 환영받지 못했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탈법이나 불공정거래의 변칙적인 수단이란 인식이 강했다. 코스닥시장 작전 세력의 ‘돈벌이’나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3자 배정 방식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2010년께부턴 ‘사모 발행=1년 보호예수’라는 등식이 자리잡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더 이상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지 말고 상법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상법에선 원칙적으로 3자 배정 방식의 자금조달을 금지한다. 무분별한 주식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주들이 보유주식만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하지만 이 같은 상법 조항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상장사들은 상법 취지를 역행하는 ‘독소 조항’을 경쟁적으로 넣고 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장사가 발행한도를 조단위로 늘리는 식이다. 단적인 사례로 코스닥기업인 피에스엠씨는 오는 21일 임시 주총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각각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57억원(12일 기준)이다.
정관만 바뀌면 문제될 게 없다. 전체 주식 수를 웃도는 규모의 신주나 CB를 3자에게 배정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상장 규정에서 전체 주식 수의 20%를 초과하는 신주를 3자 배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상법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은 크게 투자 활성화와 건전성 강화란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상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 둑이 무너졌다”며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금융감독원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하지만 금융당국이 3자 배정 방식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2010년께부턴 ‘사모 발행=1년 보호예수’라는 등식이 자리잡았다. 이후 금융당국은 더 이상 자본시장법으로 다루지 말고 상법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상법에선 원칙적으로 3자 배정 방식의 자금조달을 금지한다. 무분별한 주식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주주들이 보유주식만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하지만 이 같은 상법 조항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상장사들은 상법 취지를 역행하는 ‘독소 조항’을 경쟁적으로 넣고 있다. 시가총액이 수백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장사가 발행한도를 조단위로 늘리는 식이다. 단적인 사례로 코스닥기업인 피에스엠씨는 오는 21일 임시 주총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를 각각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457억원(12일 기준)이다.
정관만 바뀌면 문제될 게 없다. 전체 주식 수를 웃도는 규모의 신주나 CB를 3자에게 배정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상장 규정에서 전체 주식 수의 20%를 초과하는 신주를 3자 배정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상법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은 크게 투자 활성화와 건전성 강화란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상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 둑이 무너졌다”며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밀어붙이고 금융감독원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치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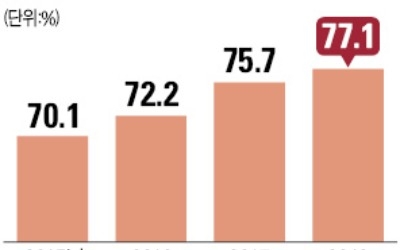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