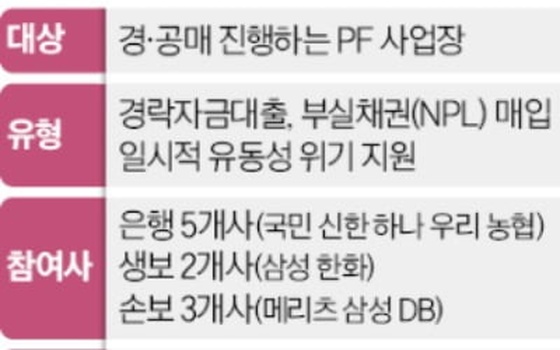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현장에서] 정권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 롯데의 눈물 끝내 외면할건가
국가안보 위해 땅 제공한 '죄'
서비스업서 세계 1위 도전하던
롯데면세점은 사드충격에 추락
![[현장에서] 정권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 롯데의 눈물 끝내 외면할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45278.1.jpg)
이런 분위기와 다른 곳이 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롯데면세점은 한산했다. 한 층에 20명 정도가 왔다 갔다할 뿐이었다. 문을 열기 전인가 싶을 정도였다. 에르메스 등 명품 매장에서도 손님을 찾기 힘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롯데 패싱 현상’이라고 부른다.
![[현장에서] 정권 바뀌어도 '대한민국 정부', 롯데의 눈물 끝내 외면할건가](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47106.1.jpg)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총괄한 뒤 롯데는 많은 것을 바꿨다. 또 바꾸고 있다. 하지만 국민 인식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 걸리고, 무너뜨리는 데는 5분 걸린다”는 워런 버핏의 말처럼.
이 문제를 기업과 정부의 관계란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다. 사드로 인한 롯데의 피해가 ‘정부의 정치적 정책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헌법 119조1항은 ‘대한민국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 헌법개정 때 경제주체로 기업이 추가됐다. 그 취지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롯데의 피해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은 고유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인지도 모른다.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롯데면세점은 세계 2위다. 2020년 1위가 목표였다. 정부도 작년 면세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드 문제 이후 해외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입찰에서 수차례 불이익을 받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포기하기 직전이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하나가 추락 직전에 몰린 셈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사드와 롯데의 피해는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김용준 생활경제부 기자 juny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 '金사과' 2탄 막아라…'김플레이션'에 사상 초유의 대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21269.3.jpg)
![[포토] 이마트, 슈퍼와인 페스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721073.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