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가 '블랙홀' 된 중국…미래 엔지니어 키우는 미국
한국행 막는 '연봉 장벽'
젊은 박사 모시기 더 어려워…단기 실적 없으면 지원도 삭감
출발부터 좌절하는 국내파
박사 받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초봉 3000만원도 채 못 받아

중국은 AI 인재의 블랙홀로 불린다. 중국 내 AI 분야 전체 인력의 40%가 미국인(링크트인 자료)일 정도다. ‘천인 계획’ 등 해외로 유학 간 자국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중국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도 효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AI 전문가 보유 순위에서 중국은 단숨에 7위로 올라섰다. 화교 출신까지 합하면 약 14만 명으로 2위인 인도(15만 명)에 필적한다.
인재난에 허덕이는 대학
4차 산업혁명 경쟁의 핵심은 ‘인재’다. 이 점에서 한국은 추격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명문대로 불리는 대학조차 신(新)산업과 연관된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해외에선 오지 않으려 하고, 국내에선 적당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서다.
연세대만 해도 기후모델링(대기과학), 구조·바이오재료(신소재공학), 지능형 시스템(전기전자공학)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학과들 대부분이 해외 교수 초빙공고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연대 공대 관계자는 “세계 수준의 석학을 특별 초빙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대 관계자도 “해외에서 유능한 교수를 뽑아놔봤자 3년 안에 실적이 없으면 재정 지원을 깎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젊은 박사들을 데려오기는 더욱 힘들다. 서울대는 실리콘밸리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AI, 빅데이터 등의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연봉 장벽’에 막혀 좌초하기 일쑤다.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아봤자…
‘국내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찾아내기는 더욱 어렵다. 대부분 대학이 재정난으로 교수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터라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해도 일자리 잡는 것부터 불투명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9세다. 불혹을 훌쩍 넘겨서 취업한다 해도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고용률은 60%지만 취업한 이들 중 43.7%가 임시직을 전전한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지방대들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교수를 확충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초봉은 3000만원이 채 안 된다”며 “정규직 교수도 연봉이 5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일도 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중 비정규직의 연봉은 2565만원이었다. 미국에선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박사 학위 소지자 중 최하(박사후과정 연구원)의 평균 연봉이 5만4403달러다.
무서운 중국의 인재 욕심
이에 비해 중국은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7월 중국 국무원이 ‘새 시대의 인공지능 발전계획에 관한 통지’라는 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 게 대표적 사례다. 계획안에서 국무원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청년 유망주에 집중해 국가 단위의 인재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은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에 인공지능 학과를 세우고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며 고등학교 과정에도 기초 인공지능 교육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처럼 고급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에선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미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가 인근 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5주간 연수를 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교사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학생들에게 가르칠 강의 계획을 짠다. 고교생들이 직접 대학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융합연구원 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디지털혁신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디지털 도구로 창의적 솔루션(해법)을 제시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구은서/성수영 기자 donghuip@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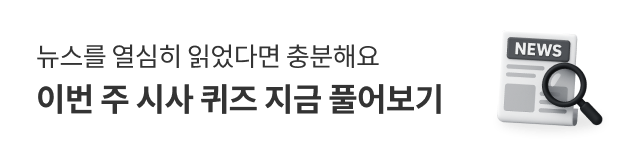





![[속보] 김 총리 "쿠팡 문제 심각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2.2257924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