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문제에 답 못주는 경제학자
우수 업적에 사후 지원으로 바꿔야
이제민 <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긍정적’ 면을 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대학의 연구 역량은 수직 상승했다. 그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싣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진국이 정한 객관적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학계의 후진성과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은 1960~1970년대 한국의 고도성장 메커니즘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반드시 그 성과를 확인했다. 그 궁극적 기준은 수출이었는데, 수출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정부는 과거 제조업을 육성한 방법을 학계에 적용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성공사례를 만든 셈이다. 선진국이 만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일차적으로 이공계지만,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는 그 상대적 ‘과학성’ 때문에 경제학 같은 학문이 두드러진다.
문제는 그때와 다른 점이 크다는 것이다. 1960~197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지만, 수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택했다. 지금은 정부가 온갖 프로젝트를 만들어 대학들을 사전적으로 경쟁시키고 있다. 대학들은 그것을 따내기 위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교수들은 스스로 연구 방향과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것은 연구를 방해하는 짓이다.
결국 학계에 대한 정부 개입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연구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바로 1960~1970년대 수출처럼 우수 업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인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 없는 경제학 같은 분야는 더욱 그렇다.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에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국제학술지 게재 능력이 있는 학자가 한국 경제에 관심을 돌리면 더 나은 실천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인정구조나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스스로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은 학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역량으로 봐 지난(至難)한 일이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있다. 정부가 대학을 서바이벌 게임으로 몰아넣는 행태를 그만두는 것이다. 정부의 그런 행태가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한국 문제를 살펴볼 여유가 없도록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장기 비전이나 목표를 보려면 시대적 흐름을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다른 요인의 상호작용, 그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런 쪽으로는 한국인이 국제적 연구 업적을 내기 어렵다. 그런데도 서바이벌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무조건 국제학술지 게재 업적 위주로 교수진을 구성하다 보니 그런 영역을 다루는 분야와 교수는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경제학자가 ‘응용수학자’라면 장기 비전이나 목표를 세우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대학 교수에 이르는 긴 교육과정에서 경제와 다른 요인의 상호작용이나 그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부가 대학을 서바이벌 게임으로 몬 결과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와 관련한 문제는 한국의 장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학계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에 대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역량이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제민 <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leejm@yonsei.ac.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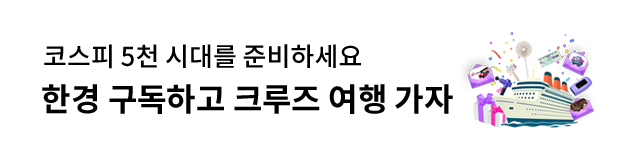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민철기의 개똥法학]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가 사법개혁 될 수 없는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6077032.3.jpg)
![[MZ 톡톡] AI,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2550279.3.jpg)
![[오승민의 HR이노베이션] 가짜 일에 빠진 조직, 진짜는 어디에?](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177150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