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독일 프라운호퍼가 웃겠다
![[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독일 프라운호퍼가 웃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02.6938183.1.jpg)
툭하면 정부조직 개편인가
기획재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국가 R&D 혁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뭘 하자는 건지 철학도, 논리도 안 보인다. 모든 게 연구소가 문제요, 평가가 잘못됐다는 식이다. 그러나 연구예산 배분의 최고 책임 부처가 어디였나. 기재부였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갖고 R&D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댄 것도 바로 기재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일언반구 반성조차 없다. 이리 평가해라, 저리 평가해라 온갖 간섭을 일삼던 부처들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이 나올 리 없다.
툭하면 정부조직 카드를 꺼내 드는 것부터가 그렇다. 미래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만든다는데 아니 정부조직이 무슨 어린애 장난감인가. 정권마다 앞 정권이 만든 조직을 싹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는 게 역겨울 정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또 없어질 게 뻔한데.
부처별로 우후죽순 들어선 18개 R&D 관리기관은 어떤가. 칸막이를 친 것은 바로 기재부와 각 부처였다. 잘못됐으면 당장 통폐합할 일이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건 또 뭔가. 안 하겠다는 얘기다. 정작 부처 이해가 걸린 일은 다 이런 식이다.
정부의 철학 부재는 정부 R&D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대목에서 절정을 이룬다. R&D로 선진국과 정면으로 겨뤄야 할 판국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디 있나. 한때는 소재·부품 연구개발 등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강조하던 정부가 이제는 정부 R&D를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만들 태세다. 이런 진입 규제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아예 R&D까지 하향 평준화하려고 작심한 것 같다.
정부는 또 정부출연연구소는 모두 중소기업연구소가 되라고 말한다. 동시에 출연연은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미래 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에 집중하라고 주문한다. 어떻게 이런 이율배반적 요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연구 자율성은 어디로 갔나
정부는 일부 출연연을 한국형 프라운호퍼연구소로 만들겠다고도 한다. 정부 예산을 받지만 민간 위탁 등 실용적 연구에 뛰어난 독일 프라운호퍼가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전에 김대중 정부가 한국형 프라운호퍼를 흉내냈다가 왜 실패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나.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기관장은 종신직이다. 보통 20년 이상이다. 더구나 독일 정부는 연구소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다. 실용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만 평균 연구기간이 5년이고 10년 넘는 장기 과제도 적지 않다. 이게 한국에서 가능한가. 국가 R&D 혁신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74328.3.jpg)
![[시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개혁 논제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20285039.3.jpg)
![[천자칼럼] 보물선 인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59578.3.jpg)


![뉴욕증시, 나스닥 사상 첫 17,000선 돌파마감...엔비디아 7%↑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90642359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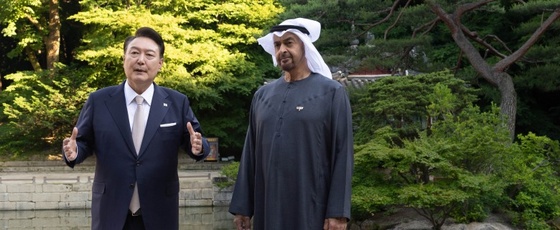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