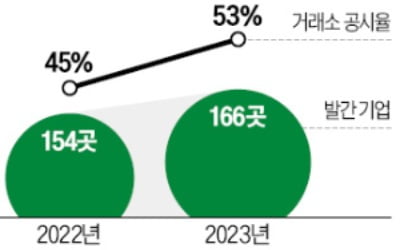[여의도 窓] '최경환 효과' 금융산업에 미칠 때
![[여의도 窓] '최경환 효과' 금융산업에 미칠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1408/AA.9017118.1.jpg)
반면 한국은 경쟁국들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혁신의 달인’ ‘추격의 달인’ ‘추월의 달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경쟁국들이다. 경제의 활로를 상당 부분 해외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갈수록 불리해지는 형국이다. 한국 경제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 등 호재도 많지만, 중후장대한 산업의 높은 비중만큼이나 기업들의 혁신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거시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전 세계 각국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기와 방법이 비슷한 ‘일치형’ 부양책을 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로 자신들의 ‘맞춤형’ 부양책으로 돌아섰다.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달라진 점을 반영하다 보니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방법과 시기도 서로 상이해진 것이다.
‘최경환 효과’라며 기대를 잔뜩 모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제 발걸음을 뗀 수준이다. 김치나 된장이 숙성되는 것처럼 ‘버무림-발효-결과 확신’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정책이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한국문화와 어울리는 것이 바로 금융산업이다. 금융산업을 키우는 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치 않아 투자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실물경제의 성장과 자산관리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도 있다.
김성욱 < SK증권 리서치센터장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