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기립박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자칼럼] 기립박수](https://img.hankyung.com/photo/201407/AA.8872631.1.jpg)
박수(拍手·applause)는 원래 가장 과격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전달방법이라고 한다. 인류학자 헨레는 박수의 기원을 포옹에서 찾는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박수가 나왔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포옹하는 동작과 박수를 크게 치는 동작이 비슷한 점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다.
고대 그리스에선 박수와 야유가 혼동돼 쓰였다. 관객들이 연극 무대에서 배우를 쫓아내기 위해 박수를 치고 야유를 퍼부었다고 한다. 박수를 빗대 앞발로 추는 춤이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다. 그래서 노래 부르거나 춤을 출 때 박수를 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보인다. 박수로 손을 자극하면 뇌기능이 활성화되고 대뇌가 쾌감을 느낀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자폐아나 외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박수 요법을 쓰기도 한다.
박수는 물론 종교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대부분 종교 의식에는 박수 치는 행위가 들어 있다. 고대 사회에선 종교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한데 묶어준 연결고리였다. 일부 종교에선 손을 비비거나 합장하는 행위보다 박수를 치는 게 훨씬 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무엇보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치는 박수는 고도의 심리적 물리적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는다. 리듬이 들어간 박수나 기립박수는 특히 더 그렇다. 월드컵의 ‘대~한민국’ 박수 등이 대표적이다. 기립박수는 리듬박수보다 더 권위적이다. 대중독재의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스탈린이나 북한 정권에서는 박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의미도 갖는다. 박수 자체가 위압적이다. 어제 월드컵 독일과 브라질전에서 독일이 일곱 번째 골을 넣을 때 브라질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독일 선수들이 선전했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브라질 선수에 대한 불만과 야유가 뒤섞였다. 고대 그리스의 무대에서 배우들이 받던 기립박수 그대로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모양이다.
오춘호 논설위원 ohch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다산칼럼] 금융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877087.3.jpg)
![[취재수첩] 美암학회에 초대받지 못한 韓 AI 신약 벤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955477.3.jpg)
![[차장 칼럼] 포기하기 전에 가볼만한 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27259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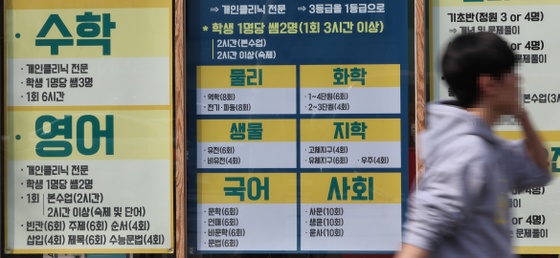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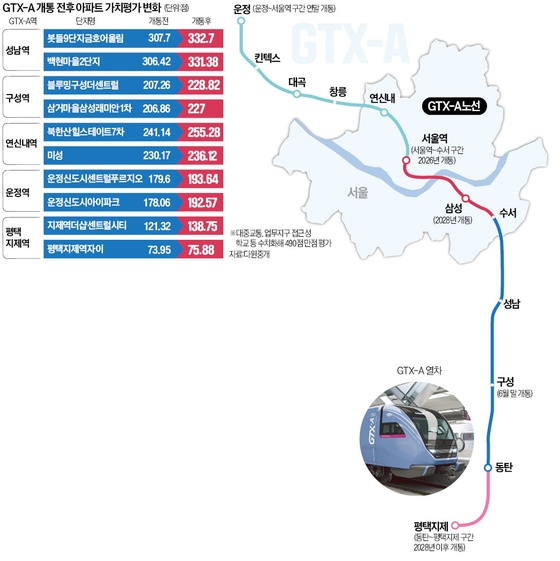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신간] 이소연 시집 '콜리플라워'](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6371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