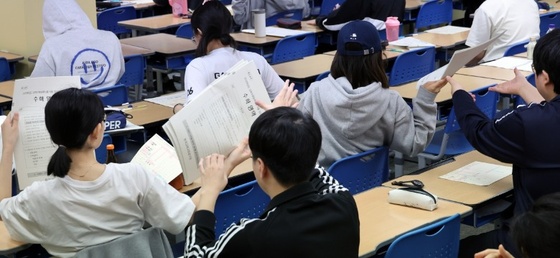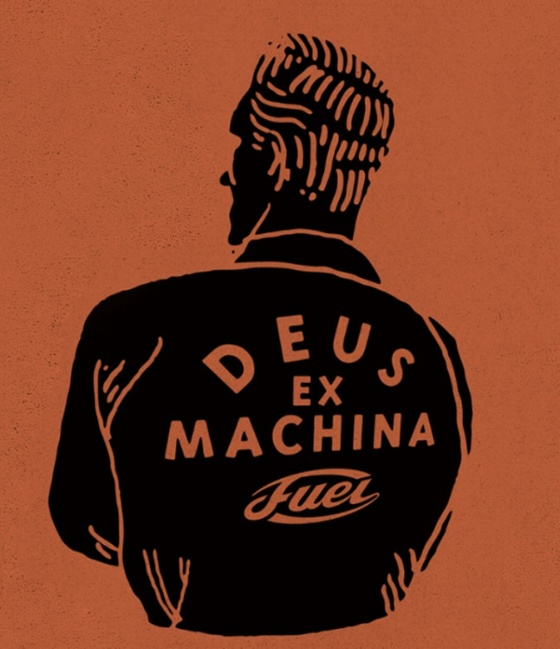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씨줄과 날줄] 오! 들길을 걸어라
걷자, 자기에게로의 귀환을 위해
장석주 < 시인·비평가 kafkajs@hanmail.net >
![[씨줄과 날줄] 오! 들길을 걸어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304/AA.7399905.1.jpg)
꿀을 구하지 못한 꿀벌이 날개를 붕붕거리듯, 먹잇감을 삼키지 못한 뱀이 똬리를 틀고 허공을 노려보고 있듯이 나는 허송세월을 했다. 한 편의 시를 짓기 위해 분노와 희망, 또는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의 맥동(脈動)과 핏속에 타오르는 격렬한 불꽃이 있어야 하지만, 내게는 그것들이 없었다. 나는 한가롭게 뒹굴며 책을 읽고, 오후에는 들길을 느릿느릿 걷는다. 이곳의 삶은 느리다. 나 역시 이 느림의 리듬을 타고 간다. 세계의 모든 시계들이 똑딱거리거나 말거나, 점점 빨라지는 시간이 격류를 이루고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든 말든, 여린 뿔을 허공에 이리저리 흔들며 느릿느릿 나아가는 풀잎 위의 달팽이 같이.
왜 오늘의 삶에는 의미가 깃들지 않는가? 왜 삶의 시간들은 의미의 결절점들을 만들지 못하고 부서져 공허하게 흩어져버리는 것일까? 느림에서 멀어지자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다. 존재의 본질에서 분리되는 위기, 자기 동일성 해체의 위기, 공허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위기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아직 느림이 있었고, 우리는 의미가 생성되는 느린 시간 속에 머물 수 있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며,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죄르지 루카치) 그 시절 여행자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 밤하늘 아래에서 노숙을 하며 신과 영원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신과 영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난청(難聽)의 시대에는 온갖 기계들의 소음에 시달릴 뿐이다.
우리는 조급성과 가속도를 얻은 대신에 느림과 심심함에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조차 심심함 속에서 머물지 못한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갖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 아울러 들길을 걸으며 제 존재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밤하늘의 별들을 우러르며 삶의 의미를 숙고하던 시간도 다 잃어버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느림이나 숙고에 대해 알지 못한다. 느림과 숙고의 바탕은 고요다. 숙고는 고요의 잉태이고, 그것의 출산이다. 숙고는 “무용한 것의 광휘 속에 빛나는 보물에 대한 약속”(하이데거)인데, 메마른 노동과 한없이 이어지는 수다떨기를 멈출 때 홀연히 나타난다. 느림과 숙고를 모르니, 숙고의 느긋함 속에서 누리던 행복도, 존재의 내면에 의미의 심연이 깃들 가능성도 깡그리 잃어버렸다. 참 슬픈 일이다.
존재의 의미는 지속과 느림에서 머뭇거리며 솟구친다. 들길을 걸을 때 심심함이 우리를 감싸고돈다. 들길에 서린 호젓함 속에서 신과 영원한 것들에 대해 사색할 때, 우리는 숙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이데거는 “들길 주위에 자라나 머물고 있는 모든 사물들, 이들의 넓이가 세계를 선사한다. 발설되지 않는 그들의 언어 속에, 독서와 삶의 노대가인 에크하르트가 말한 것처럼 신은 비로소 신이 된다”라고 쓴다. 오, 들길을 걸어라! 들길이 주는 선물을 받으라. 들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자기 안에 머무는 집중성, 자기에게로의 호젓한 귀환, 그리고 새거나 깨진 데가 없는 온전한 지속성이다.
장석주 < 시인·비평가 kafkajs@hanmail.net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환불 불가 여행상품의 덫](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74328.3.jpg)
![[다산칼럼] '요즘 세대'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변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4470121.3.jpg)
![[데스크 칼럼] 성장률 미궁에 빠진 한은과 Fed](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8010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