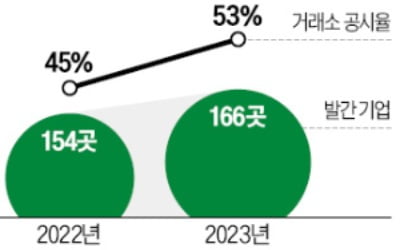[마켓인사이트] 설윤석의 재무구조 개선 '승부수'
형식상 최대주주 변경…실제는 투자 유치
세계 3위 전선업체 스미토모도 증자 참여
IB업계 "내달 초 유상증자에 긍정적 영향"
▶마켓인사이트 11월26일 오후 7시12분
대한전선이 최대주주 자리를 양보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고(故) 설경동 대한전선 창업 회장이 1955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최대주주 자리가 바뀌는 것은 처음이다.
다음달 증자를 앞두고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FI) 유치인 만큼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대한전선 경영진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상당한 모험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승부수
대한전선 최대주주인 대한시스템즈가 대한전선 신주인수권(워런트)의 50%를 대한광통신에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대한광통신은 대한시스템즈를 대신해 대한전선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된다.
대한광통신이 대한전선 증자에 참여하면 지분 11.4%를 갖게 되고, 대한시스템즈와 오너가(家)의 지분율은 7%대로 줄어든다. 증자 참여 금액은 600억원 규모다. 대한광통신은 이 자금 마련을 위해 큐캐피탈PEF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대한광통신’의 현 계열구도가 ‘큐캐피탈PEF→대한광통신→대한전선’으로 바뀌게 된다.
앞서 큐캐피탈PEF는 이달 중순께 설윤석 사장(31·사진) 등이 보유한 대한광통신 지분 42.61%를 인수했다. 업계에서는 대한전선 오너가가 대한광통신을 큐캐피탈에 판 것도 대한전선 투자유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 사장 등 대한전선 오너 일가는 큐캐피탈PEF에 최대주주 자리를 넘기는 대신 PEF의 출자자로 참여했다. 새마을금고 등 연기금이 400억원가량을 출자하고 설 사장 측은 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의 경영은 설 사장을 비롯한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맡고 3년 후엔 PEF로부터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도 갖는다.
형식상 최대주주 변동일 뿐 실제는 투자 유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I로 연기금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캐피탈PEF는 풋옵션(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과 드래그얼롱(상대방이 풋옵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지분을 같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을 확보했다.
◆내달 초 증자에 ‘파란불’
대한전선은 1955년 설립돼 창업자 고 설경동 회장과 그의 아들 고 설원량 회장이 회사를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전선업계 1위를 달렸고 창사 이후 53년간 단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우량기업이었다.
하지만 2004년 설원량 회장이 사망하고 2008년 세계 1위 전선업체인 이탈리아 프리즈미안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금 부담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2009년 5월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었다. 이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과 본업과 관련 없는 자회사를 팔았다.
대한전선은 큐캐피탈PEF 외에 해외 투자자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큐캐피탈PEF에 매각하고 남은 신주인수권(워런트) 50%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팔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최근 글로벌 전선업계 3위인 스미토모그룹을 끌어들였다. 스미토모그룹도 이번 대한전선 증자에 참여해 2%가량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IB업계에서는 국내 연기금과 외국계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투자를 끌어들임에 따라 다음달 대한전선 증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IB업계 관계자는 “증자가 완료되면 대한전선의 부채비율이 600%대에서 30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최근 시흥 공장부지 매각에 이어 안양공장, 남부터미널 용지 등의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어 추가적인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좌동욱/정인설 기자 kgb@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