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든 치우치는 게 문제
목욕,역사의 속살을 품다 | 캐서린 애셴버그 지음 | 박수철 옮김 | 예지 | 320쪽 | 1만5000원
고대 그리스 · 로마시대부터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남북전쟁,산업혁명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역사를 들추기 위한 수법은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저 엿보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탕 속에 들어가 속속들이 까발린다. 그러면서도 내용이 융숭하고 품위가 있다. 각주와 범례에 동원된 당대 지식인들 중엔 몽테뉴도 끼어있다. 심지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나폴레옹 같은 거물들도 여지없이 옷을 벗어야만 했다.
자,이제 본격적으로 탕 속에 들어가 보자.16~18세기의 유럽인들은 왕이건 농부건 하나같이 불결했다. 영국의 황금기를 이끈 엘리자베스1세 여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14세는 지독한 입냄새로 악명 높았다. 지체 높은 사람과 비천한 사람의 차이가 아마포 셔츠를 얼마나 자주 갈아 입느냐였으니 오죽했으랴.
저자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처음부터 물을 멀리한 것은 아니다. 역사가 기번이 "로마는 목욕 때문에 멸망했다"고 할 만큼 목욕탕은 향락의 장소이자 사교장이었다. 이들의 극진한 목욕 사랑은 십자군이 터키식 목욕탕인 하맘을 들여올 때까지 계속됐다. 이런 유럽에서 공중목욕탕을 일소한 것은 다름 아닌 흑사병이었다.
18세기 말 전염병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자 사람들은 다시 물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산업혁명기에는 깨끗함의 유무로 계급이 나뉘어질 정도였는데 청결이 그 시대의 문화코드이자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깨끗하다는 것만으로 문화적 우월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럽다는 것은 그 시대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구취와 체취는 파혼이나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화려해지고,청결에 대한 집착은 광기를 더해 갔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지나친 청결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세균마저 없애버렸다는 것을 현대인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불결하다는 것을 단순히 몸이 더럽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한다. 그러면서 목욕문화를 사악한 쾌락으로 여겼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씻지 않는 것이 깨끗한 영혼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들은 오히려 더러움을 흠모했다.
이쯤되면 청결의 정의가 헷갈릴 만도 하지만 저자의 주장은 이렇다. 이젠 적당히 깨끗하자는 것이다.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 더러워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깨끗해도 된다"는 스웨덴의 미생물학 교수 미트베트의 말에 저자는 쉽게 동의한다. "모두가 악취를 풍기면 냄새가 나지 않는 법"이라는 성 베르나르의 말은 이 시점에서 일반 사람들도 곱씹을 만하다.
이 책은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최고의 역사 논픽션'으로 선정한 바 있다. 서양 역사와 인문학의 몸 냄새가 그리워지면 가끔씩 꺼내서 샤워할 만하다.
전장석 기자 saka@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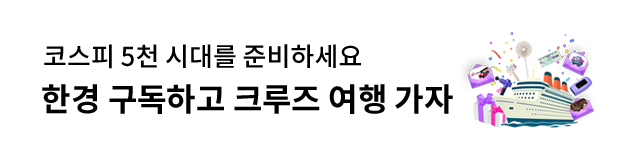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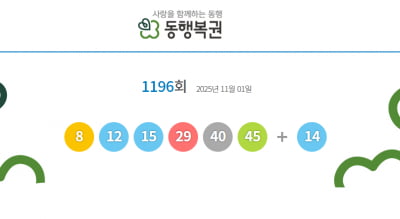
![[내일 날씨] 낮부터 추워져…강한 바람에 체감온도↓](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ZN.422205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