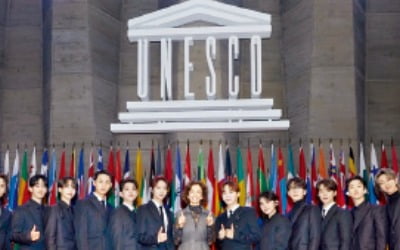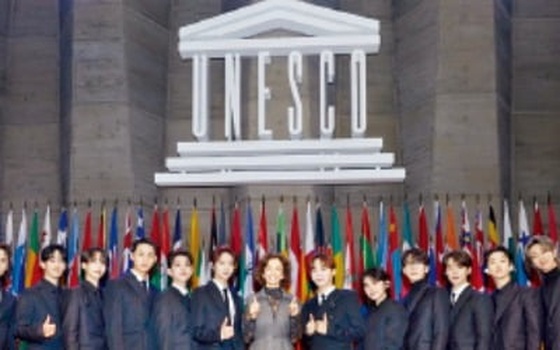[책마을] 측우기·자격루 만든 조선 천문학 '심장부' 엿보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기 것이 위대하다고 떠들어봐야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법.그런 면에서 이 책 《조선의 서운관》을 덮고 나면 왠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다. "15세기 조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첨단 관측기기를 소유했다"는 찬사를 들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중국의 과학과 문명》을 쓴 20세기 최고의 과학사 대가 조지프 니덤(1900~1995년)에게서.
이 책은 1392년부터 1776년까지 조선 천문학의 위대한 과학적 에너지를 보여주는 천문의기와 성도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다. 각종 사진과 복원도를 동원해 작동 원리까지 세밀하게 고증했으니 인문서가 아니라 기술서라 할 만하다.
저자들은 책 머리에서 조선왕조에 대한 역사적 편견부터 통렬히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조선이 신유교주의와 관료적 파벌주의로 인해 정체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 민족 중에서 한국인은 과학과 기계기술에 가장 관심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새로운 천문학 기기를 제작하기 위해 엄청난 국고를 썼고,천문학 지리학 수학에 관한 책과 각종 의기의 견본을 입수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저자들은 또 한국의 천문학이 중국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것들을 변형하여 민족적 독창성을 발휘했다고 찬사를 보낸다. 이 책에서 언급한 각종 의기와 문서 기록들은 한국과 세계과학사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서운관의 의기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조선의 천문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수많은 관측 기록과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했다는 사실에 회의적이며,자격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조선은 매우 유교적이었고 문화적으로 긍지가 높았으며 역동적이었고 천문학과 계시학의 기술을 깊이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니덤의 확신에 찬 서술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전장석 기자 sak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레깅스 입고 퇴근하기 민망했는데…" 직장인들에 인기 폭발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993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