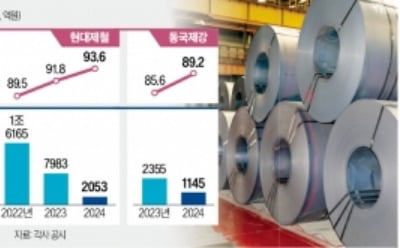영업할수록 손해…중소 해운사 "항로가 안보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루 운송수입 7개월새 94% 급락
선박값 반토막…조선사도 비명
지난 3월 하루 용선료 5만달러에 수퍼라막스급 선박(중간규모 벌크선) 6척을 1년 계약으로 빌린 소형 해운업체 S사의 K사장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달들어 화물 운송으로 버는 수입이 3000달러대로 추락,한척당 하루 4만7000달러를 앉아서 손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K사장은 "요즘 한달 수입은 업황이 좋던 상반기의 하루 수입 정도"라며 "6척을 운영하느라 한달새 1000만달러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용선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만 이 바닥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급락하는 용선료,불어나는 손실
석탄 철강석 등 건화물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지수인 BDI(발틱운임지수)가 1만선을 웃돌던 5월까지만 해도 파나막스급 벌크선의 하루 용선료는 10만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의 철광석 가격협상 불발과 경기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크게 줄면서 BDI가 1000을 밑돎에 따라 하루 용선료는 최근 3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국내 해운사들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크선 영업을 하고 있어 충격이 크다. STX팬오션,대한해운 등 대형 선사들은 호황때 벌어놓은 수익으로 버티고 있지만,벌크선을 빌려 영업하는 중소선사들은 S사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7년 범양상선(현 STX팬오션) 퇴사후 20년 동안 선박 알선업을 해 온 김해수 네오챠터링 사장은 "선박 운임 급락으로 배를 빌려서 운송영업을 하는 중소형 해운업체들의 부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자기 배를 갖고 있는 대형 해운사들도 선박가격이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 이하로 뚝떨어지면서 운임 및 선박값 하락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3년치 일감' 부실 우려?
해운업계의 불황은 조선업계 수주물량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해운,S해운 등 자사 보유선박이 100척을 넘는 해운사들은 벌크선에서 번 돈으로 새 선박을 발주해 왔다. 이들은 해운업 불황으로 선박 가격이 급락하자 조선업체에 지급할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주한 선박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액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체 자금으로 중도금을 막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선박 발주에 많은 돈을 퍼부은 선사들로선 어쩔 수 없이 보유 선박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이는 다시 중고선박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카스메드타임 등 국내 선박중개 전문회사에 따르면 자기 배를 많이 갖고 있는 해운사들도 경기 침체로 몸집을 줄이려고 선박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초 1억달러였던 케이프사이즈급 선박은 절반 이하로 값이 떨어졌으나 넘치는 매물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발주 당시에 비해 선박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져 계약을 깨고 배값의 10~30%인 선수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며 "해운업황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잇딴 신규 선박 발주계약 포기로 조선업체들이 확보해놓은 '3년치 일감'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조조정 대상은 '그린 필드 조선사'
해운업황 악화가 조선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조선업 호황으로 목포 대불공단,남해,진해,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를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생 조선사들중 상당수가 자금난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대형 조선업체들이 넘치는 수주물량을 소화하려고 선박블록 등을 이들 업체에 아웃소싱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조선업 호황에 편승하기 위해 도크 등 선박 제조에 필요한 기본 설비조차 갖추지 않고 조선업체로 상호만 바꿔 '풀만 자란 맨 땅'에서 수주에 나섰던 업체들"이라며 "이른바 '그린 필드(green field) 조선사'로 불리는 이들 기업은 건조 주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금융권이 RG(Refund Guaranteeㆍ선박 선수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환급보증)를 내주지 않아 사업포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선박값 반토막…조선사도 비명
지난 3월 하루 용선료 5만달러에 수퍼라막스급 선박(중간규모 벌크선) 6척을 1년 계약으로 빌린 소형 해운업체 S사의 K사장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달들어 화물 운송으로 버는 수입이 3000달러대로 추락,한척당 하루 4만7000달러를 앉아서 손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K사장은 "요즘 한달 수입은 업황이 좋던 상반기의 하루 수입 정도"라며 "6척을 운영하느라 한달새 1000만달러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용선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만 이 바닥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급락하는 용선료,불어나는 손실
석탄 철강석 등 건화물을 실어나르는 벌크선의 운임지수인 BDI(발틱운임지수)가 1만선을 웃돌던 5월까지만 해도 파나막스급 벌크선의 하루 용선료는 10만달러를 웃돌았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의 철광석 가격협상 불발과 경기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크게 줄면서 BDI가 1000을 밑돎에 따라 하루 용선료는 최근 300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국내 해운사들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크선 영업을 하고 있어 충격이 크다. STX팬오션,대한해운 등 대형 선사들은 호황때 벌어놓은 수익으로 버티고 있지만,벌크선을 빌려 영업하는 중소선사들은 S사처럼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7년 범양상선(현 STX팬오션) 퇴사후 20년 동안 선박 알선업을 해 온 김해수 네오챠터링 사장은 "선박 운임 급락으로 배를 빌려서 운송영업을 하는 중소형 해운업체들의 부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며 "자기 배를 갖고 있는 대형 해운사들도 선박가격이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 이하로 뚝떨어지면서 운임 및 선박값 하락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3년치 일감' 부실 우려?
해운업계의 불황은 조선업계 수주물량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해운,S해운 등 자사 보유선박이 100척을 넘는 해운사들은 벌크선에서 번 돈으로 새 선박을 발주해 왔다. 이들은 해운업 불황으로 선박 가격이 급락하자 조선업체에 지급할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주한 선박의 담보가치가 떨어져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액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체 자금으로 중도금을 막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선박 발주에 많은 돈을 퍼부은 선사들로선 어쩔 수 없이 보유 선박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이는 다시 중고선박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카스메드타임 등 국내 선박중개 전문회사에 따르면 자기 배를 많이 갖고 있는 해운사들도 경기 침체로 몸집을 줄이려고 선박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초 1억달러였던 케이프사이즈급 선박은 절반 이하로 값이 떨어졌으나 넘치는 매물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발주 당시에 비해 선박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져 계약을 깨고 배값의 10~30%인 선수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며 "해운업황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잇딴 신규 선박 발주계약 포기로 조선업체들이 확보해놓은 '3년치 일감'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구조조정 대상은 '그린 필드 조선사'
해운업황 악화가 조선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조선업 호황으로 목포 대불공단,남해,진해,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를 따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신생 조선사들중 상당수가 자금난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대형 조선업체들이 넘치는 수주물량을 소화하려고 선박블록 등을 이들 업체에 아웃소싱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조선업 호황에 편승하기 위해 도크 등 선박 제조에 필요한 기본 설비조차 갖추지 않고 조선업체로 상호만 바꿔 '풀만 자란 맨 땅'에서 수주에 나섰던 업체들"이라며 "이른바 '그린 필드(green field) 조선사'로 불리는 이들 기업은 건조 주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금융권이 RG(Refund Guaranteeㆍ선박 선수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환급보증)를 내주지 않아 사업포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