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당 추락… 당정관계 변화 불가피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한 축인 우리당의 원내 2당 추락으로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회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각종 국정현안은 국회 논의단계에서 부터 출구를 찾지 못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당정청간의 최고 채널이라 할 수 있는 `4인회동'은 당청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연말부터 가동중단 상태이고, 고위당정협의도 연초부터 잇따른 탈당 여파로 맥빠진 상태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탈당파 상당수가 건교위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방통융합, 출자총액제한제,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과 사학법, 사법개혁법 등 민생.개혁입법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작업 역시 다당제로의 정당구조 재편으로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또 9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간 회담도 그동안의 여야관계로 볼 때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속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한나라당과 새 교섭단체 등을 각개격파식으로 접촉하며 설득해 나가야 할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대(對)국회 업무의 컨트롤 타워격인 총리실은 야당과의 접촉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집권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통상적인 당정관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당을 뜻하기 때문에 당정협의 등 당정관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명맥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정간 조율이 예전처럼 힘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탈당 변수가 현실화될 경우 집권여당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져 여야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정관계'는 새로운 기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존의 여야 구별은 없어지게 되는 만큼 그동안 집권여당인 우리당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당정협의 관계는 우리-한나라당-새 교섭단체 등에 대한 `등거리 체제'로 변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위당정 등 기존의 당정협의는 물론 한명숙(韓明淑) 총리 체제 출범 이후 `4인 회동'의 형식으로 진행돼온 당정청 채널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여야를 초월해 부처별, 범정부 차원에서 당별로 협의를 벌여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입법여건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집권 말기인 2002년에도 대통령의 탈당과 맞물려 고위당정이나 당.정.청 협의채널은 중단됐고, 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협상을 강화해야 했다.
또한 당시 여성장관이었던 한명숙(韓明淑) 총리 등 당 출신 각료들도 동반 탈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노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된 이후 전면 개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한 총리 등 당 출신 각료들은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해졌으며 그만큼, 제1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책임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한 총리의 경우 당적 문제에 있어선 대통령과 함께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윤석열은 갑갑, 이재명은…" 유승민에 쏠린 정치권의 눈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286599.3.jpg)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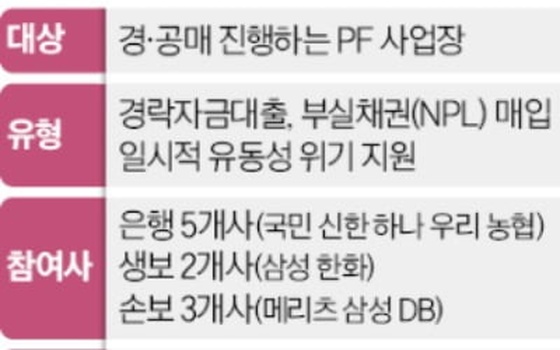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22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