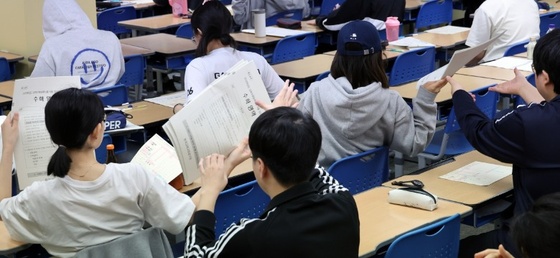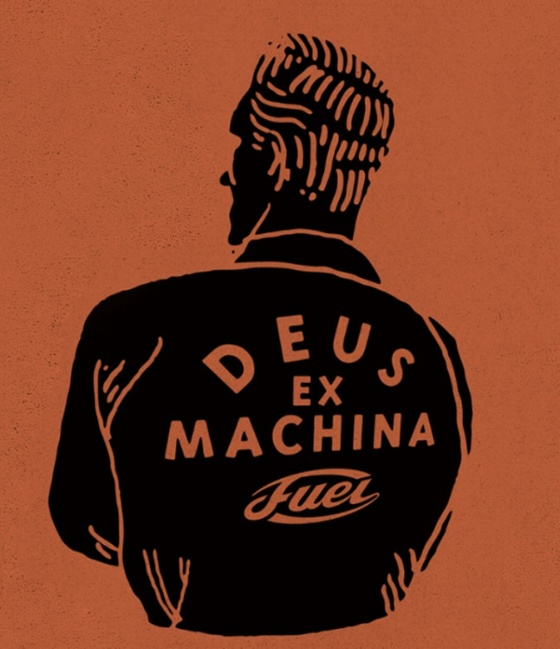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다산칼럼] 보이는 善,숨겨진 惡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경제에도 체제에 관계없이 공히 적용되는 철칙(iron law)이 있다. 그것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주술(呪術)이 아닐 수 없다. 그같은 혜택을 누리는 국민을 계속 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상낙원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포퓰리즘적 기만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회주의 비전이다. 포퓰리즘에 기초한 약속은 경제철칙에 반(反)하기 때문에 허구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허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약자보호라는 명분 하에 선의(善意)로 설계된 정책을 통해 성취될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그 기대에 '정반대'되는 것을 예측하면 된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그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예컨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계층의 사람을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 이처럼 포퓰리즘은 왜곡(歪曲)된 결과를 초래(招來)한다.
포퓰리즘은 정치인에게 있어 빠지기 쉬운 함정이자 유혹이다. 좋은 효과(善)만 드러내보이고 부정적 효과(惡)는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선'(善)은 쉽게 드러나고 가시적이지만,'악'(惡)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적 효과가 쉽게 인지되지 않음은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중적 지지도를 높이되 그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정치인에게 포퓰리즘은 어찌 보면 합리적 선책일 수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큰 정부론'은 고용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책임론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그 증거이다. 이는 정부가 최후의 고용자(last resort)임을 자임한 것이다. 정부는 그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정부가 쓰는 만큼 민간부문의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고용증가는 일정부분 민간부문의 고용을 밀어낸다. 정부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은 정부정책의 수혜자들이며,사회적으로 공지된다. 그러나 공공부문 확대로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정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창출(創出)된 정부고용이 감소된 민간고용보다 더 생산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큰 정부'는 종국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낮춘다.
정치인은 선의와 공익을 주창하지만,그들의 행동은 사익(私益)에 의해 이끌린다. 공인(公人)으로서 그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주장할 수도,지켜지지 않을 것을 약속할 수도,바람직하지 않은 법안임을 알면서도 입법통과 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선자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정치적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었다면,우리는 '이상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은 그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국민의 판단 잘못이다.
대통령 선거는 포퓰리즘이 횡행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산업화로 축적된 물적 토대를 민주화를 통해 원칙 있게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금 현혹된다면,반값 아파트에 이어 반값 등록금이 지지를 받는다면,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아랑곳하지 않는 임기말 개헌논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한국의 미래는 없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은 개인도 사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2007년은 한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한 해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선별안이 절실하다 하겠다.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환불 불가 여행상품의 덫](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74328.3.jpg)
![[다산칼럼] '요즘 세대'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변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4470121.3.jpg)
![[데스크 칼럼] 성장률 미궁에 빠진 한은과 Fed](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8010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