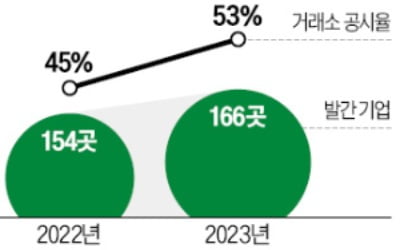입력2006.04.03 01:47
수정2006.04.03 01:50
올 들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20억원 미만 소액공모도 덩달아 급증,주의가 요망된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돼 감독당국의 깐깐한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공모,이미 작년 수준 초과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기업들의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모두 1477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3.6%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1년간 소액공모 금액(1427억원)을 앞지른 것이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0년 도입된 이후 사상 최고치(2003년,1578억원) 경신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5월 소액공모 건수도 103건으로 전년동기(46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소액공모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무엇보다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기업 입장에선 감독당국의 눈을 피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에 별도의 발행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다 증자 과정에 주간사 증권사가 끼지 않는 게 일반적이어서 주간사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까다로운 은행대출 대신 소액공모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하지만 소액공모는 태생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증자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 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스닥기업 M사는 작년 하반기 60억원의 증자를 추진하다 금감원의 자료보완 요구로 취소되자 소액공모로 방향을 전환,19억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소액공모 직후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실상 '이름만 공모'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코스닥기업은 최근 소액공모를 실시하면서 서울 본사에서 단 하룻동안만 청약을 실시,투자자들로부터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홍석 금감원 기업금융제도 팀장은 이에 대해 "소액공모는 기업들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유심히 살펴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