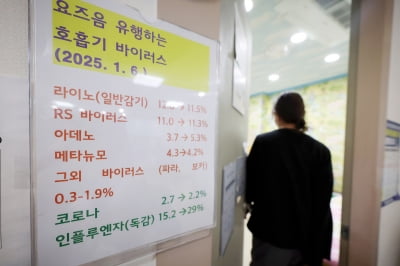지난 겨울 미국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9·11 테러 여파라고 하지만 외국인 참가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은 '철저'를 넘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올림픽 후원업체 CEO(최고경영자)조차 공항에서 양말까지 벗겼다.
개막식에 9·11테러 현장에서 수거된 대형 성조기가 입장하면서 올림픽은 '상처입은 미국인 애국심 고취의 장'이 됐다.
그때 우리는 '스포츠제전이란 개최국의 국내용 잔치 성격이 짙게 마련'이라고 봐 넘겼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월드컵의 '옥에 티'를 보도하는 일부 외국언론의 시각은 실망스럽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6일 "FIFA는 앞으로 아시아 개최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월드컵 표 판매 문제 △다른 나라 경기의 저조한 관중 등을 들었다.
하지만 표 문제 등은 '아시아 탓'이 아니라 서구선진국이 주도하는 'FIFA의 수준이하 운영 탓'이다.
이 신문은 또 미국 유럽의 축구팬들이 비싼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아시아까지 날아가기 힘든 것도 이유의 하나로 꼽았다.
이 신문 지적대로라면 '아시아는 돈만 대고 잔치는 유럽이나 미국이 즐기는 식'이어야 바람직하다는 얘기니,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오늘날 어떤 세계 스포츠제전도 한국과 일본 대기업의 후원없이는 제대로 치러질 수 없다는 사실을 서구인들은 명심할 때가 됐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 '(붉은 악마는)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위협적이며,열정은 히스테리에 가깝다'면서 '한국인은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응원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축구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라고 비웃었다.
그런 영국은 수년 전 국가대항전에서 영국이 독일에 지자 런던 밤거리를 거닐던 러시아인을 독일인으로 오인해 살해한 사건이 터질 정도로 '반독(反獨)'감정이 하늘을 찔렀다.
영국이 원조로 알려진 '훌리건'만 하더라도 축구를 통해 화풀이하는 폭력적인 건달들로 '축구발전의 암적 존재'여서 출국이 금지될 정도다.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그것도 두 나라가 공동개최한 한·일 월드컵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일부 언론의 비꼼은 '아시아 발흥에 대한 부러움의 발로'라고 믿고 싶다.
김수찬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


![[단독] "5년치 일감 쌓여"…미국서 '돈벼락' 맞은 한국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0957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