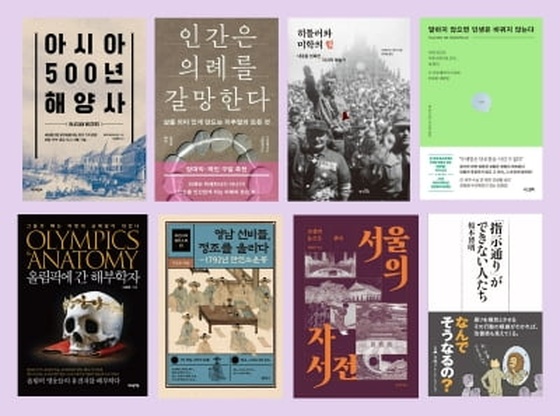입력2006.04.01 21:26
수정2006.04.01 21:29
2001년 6월,서울의 화제는 북한선박의 영해침범,기업의 해외이전,그리고 초여름의 긴 가뭄이다.
1950년 6월 필자가 어린 시절 살던 강릉 가까운 바다에 홀연 적군 함선이 나타나 이를 격퇴하려는 아군 포대의 포성이 간간이 들려왔다.
사흘 뒤 도시에 진입한 인민군의 장비를 보고 국군의 장비열세를 실감케 했다.
해방 직후 좌우충돌과 전쟁경험을 통해 이념투쟁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세대와 모르는 전후세대와의 시국관이 대조를 이룬다.
61년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권위주의 세력이 장기집권을 위해 때로는 남북대립을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폐습이 없지 않았다.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운동 확산,동서 냉전체제의 붕괴,그리고 민주운동권 인사들의 집권성공으로 이데올로기 대립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때가 온 듯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있어서는 전통사회의 잔재인 가족세습주의와 낡은 정치경제이념인 공산주의로 정신 무장된 체제가 북쪽에 여전히 버티고 있다.
6·25 당시 우리에게는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도 적의 도발에 맞서 대응하는 군대가 있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는 우세한 무장을 갖춘 우리 군대에 결연한 군인정신이 결여돼 보인다.
그간 잦은 북방한계선 침범에 미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우리 해군이 제주 북방 영해해상에 나타난 북한 상선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이들 선박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항로를 개척하면서 남한 당국의 대응상황을 살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 한다.
김정일의 서울답방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밀어붙이면 밀려주는 것이 국토방위의 자세일 수 없다.
세계정세에 어둡고 북한의 의도를 몰랐던 정치인들과 적에 맞설 무기가 없던 군대 때문에 6·25 참화를 겪었다.
요즘엔 우세한 장비를 갖췄지만 국방의식이 흐트러진 수뇌부 때문에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국민은 과거처럼 군인정치가들의 등장을 선호하지 않듯이,요즘처럼 정치권 눈치보는 군인들도 미더워하지 않는다.
다시 반세기전 해마다 춘궁기를 당연시했던 시대로 되돌아 가보자.당시 강릉은 풍광이 빼어난 고장이었다.
요즘처럼 도심이 복잡하고 특색이 없는 곳이 아니었다.
시내 시장거리의 가게들은 대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취급했고,공산품이라야 단순가공품뿐이었다.
거리통행도 한가했다.
정미소 양조장 자전거포 등 몇곳을 빼면 기업다운 기업이 없었다.
영국 산업혁명기에 매연이 심했던 블랙 컨트리 얘기가 부러워 오히려 푸른 하늘과 맑은 강의 고마움을 몰랐다.
60년부터 30여년간 집권한 군사 권위주의 정권들은 한가지 공적이 있었다.
그들은 정통성의 약점 때문에 경제개발에 힘썼다.
국민경제는 규모면에서 세계 랭킹 12위쯤으로 발돋움했다.
반세기는 커녕 30년 전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다.
산업단지들이 마련되고 굵직굵직한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의 해외이전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그룹도 예외가 아니다.삼성SDI 수원공장은 브라운관 생산라인 6개 중 2개를 중국 광주로 이전을 결정했다.생산직 노동자 4백여명이 생산라인에서 물러나게 됐다. 오래 전부터 신발ㆍ봉제ㆍ섬유 등 사양업종의 기업탈출이 꾸준히 지속돼 왔다.
근래에는 전자ㆍ통신장비 등 성장산업분야에서도 해외탈출이 늘어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낸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제일모직 이건창호시스템 오리엔트 등이 그 예다.당해 기업들이 밝힌 해외이전 동기는 '현지시장 공략''생산거점의 글로벌화'이지만,밑바닥엔 강성노조의 공격,정부규제,시민단체의 간섭,국민의 반(反)기업정서 등이 깔려있다.
크게 보면,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기업들이 자리잡기 위해 기존업종 기업들의 대거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길게 보면 도발사건마다 강경대응하거나,거래건수마다 철저히 추궁하지 않는 편이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유효했다고 평가될 날이 올 수도 있다.
문제는 국내 노동인구를 충분히 고용할 신규사업들이 아직 떠오르지 않고,북한은 전혀 변화할 조짐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여름 가뭄은 왜 이리도 심신을 지치게 하는가.
pjkim@ccs.sogang.ac.kr
![[한경에세이] 행복하기 그리고 잊지 않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특파원 칼럼] 100년 후 연금까지 고민하는 일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64071.3.jpg)
![[홍영식 칼럼] 헌법 전문은 '장바구니'가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703783.3.jpg)


![전산장애 소동에 깜놀한 美 투심...다우 0.3%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406334828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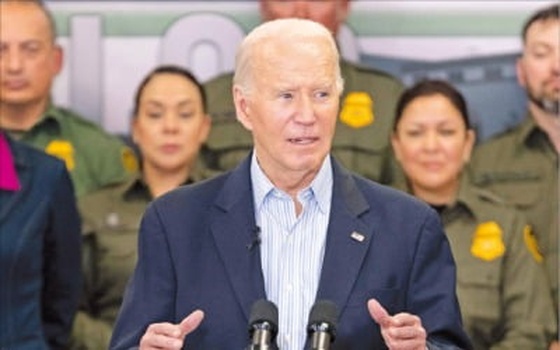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