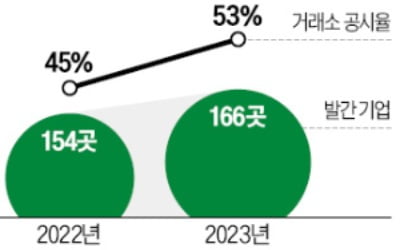['정현준 게이트'로 본 '사설펀드'] 벤처거품 먹고 자란 '證市독버섯'
물론 벤처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증시 저변을 넓힌다는 순기능도 있다.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대량 매물로 찬물을 끼얹고 주가가 떨어지면 소위 ''작전''으로 주식시장의 질서를 흔들어 놓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현행 투자신탁업법에 저촉되는 단속의 대상이긴 해도 가입자들조차 몇몇을 빼고는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조직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 벤처거품이 사설펀드를 키웠다 =사설펀드는 벤처거품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D증권 명동지점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부분 특정종목에 공동투자하는 투자클럽처럼 운영됐으나 프리코스닥이 뜨면서 사설펀드 형태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사채업자와 큰손이 대박을 겨냥, 프리코스닥 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펀드처럼 운용됐다는 것이다.
물론 사설펀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알음알음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돈도 끌어들였다.
세(勢)를 과시하거나 자금동원의 편의를 위해 정.관계 관계자들을 끌어들이고 때로는 M&A 부티크 등과 손을 잡기도 한다.
또다른 D증권 관계자는 "이미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원금과 이익금을 배분하고 해체된 것까지 포함하면 사설펀드는 줄잡아 1백여개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설펀드는 10억~30억원 규모가 주류를 이루나 큰 것은 1백억원을 넘기도 한다고 전했다.
실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상반기에 조사를 벌였으나 실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설펀드들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작전을 동원했다.
H증권 관계자는 "사설펀드는 성공불 조건으로 여의도를 이탈한 증권 투신 인력들을 끌어들여 주가띄우기에 나섰다"고 귀띔했다.
◆ 프리코스닥이 주요 타깃 =사설펀드들은 코스닥기업에도 투자하지만 그보다는 프리코스닥 기업에 더 많은 돈을 찔러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넷 IT(정보기술) 등 유망하다 싶은 기업은 대주주로부터 액면가의 20∼30배 수준에서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
사설펀드의 운용기간은 보통 1년이다.
이 기간중 주가가 올랐다면 별 문제는 없다.
사들였던 주식을 시장에서 팔아 남는 돈을 배당하고 해체하면 그뿐이다.
그러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사설펀드는 작전세력으로 돌변한다.
"지분 거래로 안면을 익힌 터라 대주주와 사설펀드는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해 주가부양에 나선다"는게 증권사 정보담당자들의 말이다.
''정현준.이경자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설펀드는 신용금고 등과도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쉬운 데다 신용금고는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주식 매수주문때 위탁증거금이 필요없다.
얼마든지 허수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장외시장 사이트 운영자는 "대출금리가 낮아 자금운용에 골머리를 앓던 신용금고로선 ''우량고객''인 사설펀드가 요청하는 주식 허수주문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벤처기업 대주주도 문제 =사설펀드에 매각한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되사주는 조건을 제시한 대주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가가 떨어지면 대주주들은 사설펀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사설펀드가 요구하면 액면분할도 해야 하고 무상증자도 해야 한다.
그래도 주가가 뜨지 않으면 사설펀드가 작전에 나선다.
작전은 평소 거래자금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실탄을 확보한 뒤 시작한다.
사설펀드가 작전개시 신호를 보내면 벤처기업 쪽에서 각종 호재성 재료를 발표한다.
때로는 자사주매입, 대주주지분확대 등으로 화답하기도 한다.
주가가 올라가면 사설펀드는 즉각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빠진다.
결국에는 애매한 일반투자자들만 덤터기를 쓰고 만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