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철권통치 종식] '시민혁명' 독재자 몰아냈다..'향후 유고정국'
지난달 24일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시민과 야당의 밀로셰비치 퇴진운동과 민주화운동은 급기야 13년간 계속된 철권통치를 붕괴직전으로 몰고 갔다.
사실 그의 몰락은 국제사회에서는 시간문제로 여겨졌었다.
알바니아계 인종청소를 감행한 코소보사태를 일으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공습을 받고 국제전범으로 기소된 그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왕따''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밀로셰비치가 그나마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해온 것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무력통치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특유의 정치기술 때문이었다.
그러나 강력해 보였던 통치구조는 일단 세르비아의 근로자들이 베오그라드의 중산층 지성인들과 학생들의 시위에 가담함으로써 와해됐다.
수년간의 경제침체와 국제적 고립은 한때 열렬한 인기를 끌었던 밀로셰비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서서히 약화시켰다.
반면 실현불가능한 선거공약을 자제한 야당연합 대선후보인 보이슬라브 코스투니차는 밀로셰비치의 술수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궁지에 몰린 밀로셰비치는 야당이 집권하면 유고는 서방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단골메뉴였던 ''반(反)서방 기치''도 이번엔 먹혀들지 않았다.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마저 시위자들에게 투항하는 등 그에게 등을 돌리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현재 밀로셰비치는 동남부 도시인 보르에 숨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곤경에 빠진 밀로셰비치가 최후의 수단으로 특수부대를 동원,마지막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민심을 다시 수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선태 기자 orc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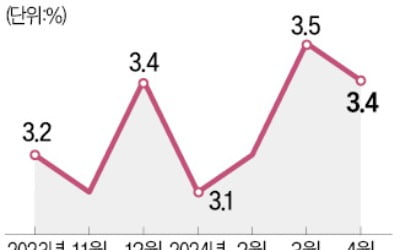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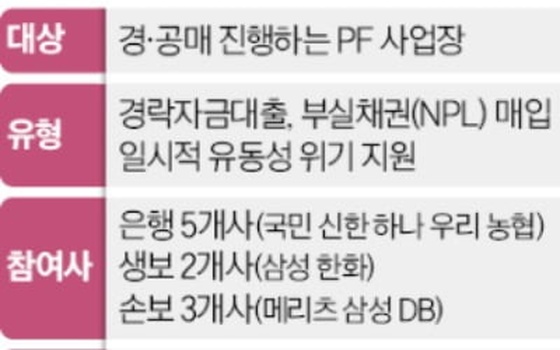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22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