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극적 타결] 정부주도 금융개혁 '險路' 예고..과제/전망
정부는 한빛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정책을 강제로 추진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국을 막았고 노조는 정부 주도의 "칼질"을 막아내는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서로에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볼수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강제 통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은행들 스스로 자구계획을 만들어 시장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은행들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하면서 지주회사식 구조조정을 피할 경우에는 정부가 염두에 둔 2차 구조조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파업에서 참가율이 가장 높았던 은행은 한빛 조흥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들이다.
그만큼 해당 은행 직원들은 다급하고 절실했다는 얘기다.
금감위 관계자는 "조흥은행의 경우 독자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홀로서기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막판까지 노조가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스스로 살게 내버려 둘 경우 정작 시장에서 문제가 터진 뒤엔 손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우량은행들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어쨌든 은행은 정부가 씌워준 금융지주회사란 "핵우산" 대신 시장에서 폭풍우를 이겨내야 한다.
노조가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으로 비를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차피 빠질 돈은 개인의 소액자금이 아니라 큰손이나 기관의 수십억, 수백억원의 거액자금이기 때문이다.
은행파업은 정부에 관치금융 청산이란 반성의 계기를 갖게 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대신 총리훈령 형태로 내각차원에서 관치금융이 없다는 선언을 할 계획이다.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 이 참에 대출압력, 인사개입 등을 근본적으로 뿌리뽑는다면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도 소망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노조 파업사태는 몇가지 과제도 남겨 놓고 있다.
정부가 금융개혁의 큰 틀은 지켜냈지만 금융지주회사 예금부분보호제 등의 큰 원칙도 흥정거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집단이기주의를 경고했지만 의료대란처럼 집단행동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선례도 남겼다.
이제 정부와 노조는 사상 초유의 은행 파업사태를 서둘러 봉합하고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을 합치고 서둘러야 할 때다.
정부가 노조의 협상요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2단계 금융개혁이 금융종사자들의 협조와 참여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단계 개혁이 강제합병 감원 등 외과수술이었다면 2단계는 소프트웨어와 질적 개선을 위한 내과수술이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파업문제는 금융개혁에 대한 정부의 임기응변식 대응책이 만들어낸 불행한 사태"라면서 "정부는 장기적인 구조조정 전략과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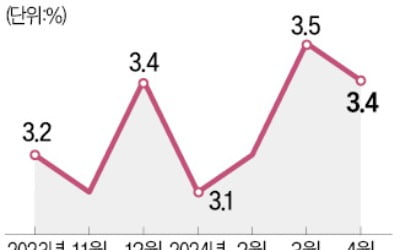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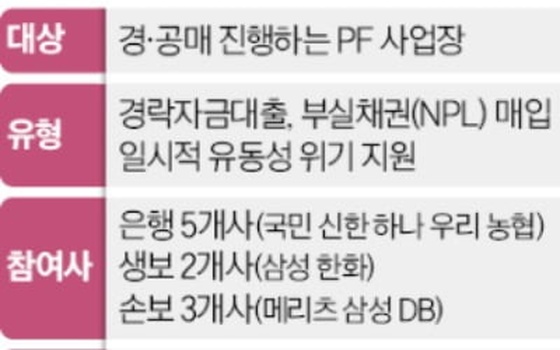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22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