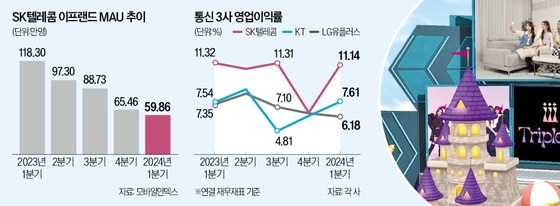[B&M] (New Trend) 미국식 인센티브 경영 일본서 '특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일본기업들간에는 보너스를 줄이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고안자에 대한 장려금이나 스톡옵션(자사주 구입권) 도입과 같은 것이
주류를 이룬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이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고.려.인.삼(참)"(고려인삼)의 조건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이색적인 리포트를 하고 있다.
도시바에는 올해 인센티브로만 5백만엔이상을 받는 직원이 나온다.
지난해 특허장려금을 종전의 10배인 연간 1천만엔으로 확대시켰다.
원래 다른 업체에서 라이선스사용료를 얻게 된 특허나 자사제품에 사용되는
특허의 고안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라이선스 수입에 공헌한 특허로 대상을
확대시켰다.
장려금은 특허권이 지속되면 계속 지급된다.
한해 받고 끝나는게 아니다.
제약회사인 다케다약품공업도 신제품의 매출액 특허의 독자성에 따라 연간
1천만엔까지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비해 GE요코가와메디컬, 캡컴(Capcom) 등은 스톡옵션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자극한다.
합작회사인 GE요코가와메디컬의 경우 모기업(GE) 주식 구입권을 받는다.
GE의 주가가 수년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어 3년전에 받은 스톱옵션을 행사
하면 단숨에 1천만엔이상의 수입이 생긴다.
인센티브의 도입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쉽게 설명된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게 일본기업들의 경영환경
이다.
여기서 전체적인 인건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법이 바로 일시금으로 지불되는 인센티브제도다.
그러나 이런 금전적인 장려제도가 회사경영에 플러스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고다.
어차피 직원들에게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선 거액이어야
한다.
10년동안 열심히 모아도 만져보기 어려운 거금을 내걸어야 비로소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실제 거액을 거머쥔 직원이 등장하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다른 직원들의 관심이 일거에 집중된다.
둘째 조건은 려다.
이는 깨끗하게 처리하라는 뜻이다.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를 받은 사람을 인사이동이나 승진심사때
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구차하게 애매모호한 조건을 내걸어 회사가 말로만 그럴싸하게 포장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만약 인센티브를 일과성으로 끝내지 않고 나중에 인사고과에 연결시키거나
한다면 다른 사원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셋째는 인이다.
해당자에게 바로 지급하라는 얘기다.
일본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화합을 중시한다.
팀워크가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부서일동을 대상으로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가 갖는 본래의 "근로의욕고취"란 취지가
퇴색된다.
팀단위로 이뤄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복수의 팀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라도 각 팀원의 공헌도를 회사가 공정하게 심사, 아예
장려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쪽이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
어차피 "돈"을 당근처럼 이용해서 근무의욕을 키우겠다는 것이므로 장려금
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보다 세분화된 공헌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로 삼이다.
고려인삼이란 조어를 만들기 위해 "삼"이라 했지만 이는 참여를 의미한다.
인센티브제도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 부서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그어져 있으면
역효과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특허에 관한 인센티브는 "연구부서 사람들의 잔치"라고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실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오므론에서는 특허인센티브가 있지만 이에 참여할 수있는 대상을 영업
마케팅 생산 등 전사원으로 꾸준히 확대시켜 왔다.
영업이나 마케팅부서는 고객과 항상 대면한다.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
이를 제품생산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이것이 제품화돼 특허로
연결되는 경우 제안자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게 된다.
스톡옵션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대개 경영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일본
에서는 직원이면 누구라도 대상이 된다.
< 박재림 기자 tr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녹색해운항로, 국제 해운 탄소중립 실현의 바닷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451233.3.jpg)
![[한경에세이] 세금에 대한 단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AI 베일 벗은 애플은 1.91%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106260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