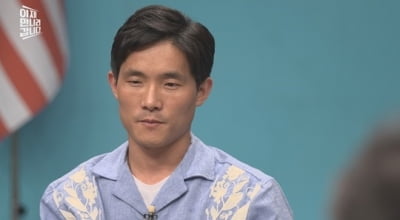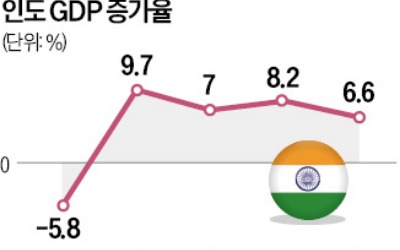죄수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귀양간 죄인들을 복권시켰다.
특히 새로 즉위하는 왕의 교서는 어김없이 사면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단지 반역죄, 직계존속 살인구타죄, 독살죄, 강도죄를 범한 자는 사면에서
제외됐다.
국왕의 특권이었던 왕조시대의 사면은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도 음양의 조화가 깨어져 군왕의 덕이 손상되고 재앙이 일어난다는 동양
사상에서 유래됐다.
그야말로 국민의 "화합"을 중시한데서 나온 제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진 사면은 제도화 형식화돼 "은사"라고 불렸을
만큼 왕의 사적이고 정치적인 특권으로만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시국이 혼란할때 앞다투어 올라온 권신들의 상소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결
같이 "대사면과 복권" "인사개혁"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주류.
그때마다 뜻있는 선비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주 사면을 하면 법의 권위를
떨어뜨려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사면반대논리를 폈지만
대부분 허사였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익은 사면반대론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초 태종의 실정을 간하다가 곤장 1백대를 맞고 관노가 됐던 선비
방문중은 37년동안 종살이를 한뒤 단종때에야 복권됐다.
또 노산군으로 강등됐던 단종이 복권된 것은 2백47년이 지난 뒤였다는
사실은 조선조의 특사가 점차 정의나 민심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 정략적
민심수습책으로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국민의 정부가 4번째로 오는 광복절을 맞아 3천여명의 특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의 관심사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도 사면복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이다.
여론이 "정략적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래야만 지역화합정치안정을 이를수 있다는 발상도 어쩌면 그렇게 옛
정치인들과 같은지 모르겠다.
"상벌이 중도를 잃으면 사시가 순서를 잃는다"는 옛말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


![[한경에세이] 옷을 뜯어먹는 염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510855.3.jpg)
![[아르떼 칼럼] 한 테이블에 앉은 영국인과 중국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7.38863970.3.jpg)
![[천자칼럼] 3차 핵시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6385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