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개월] 제1부 기업 패러다임 : '살아 움직이는 조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조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군대식 관료조직에서 유기적 팀조직으로의 전환이 변화의 요체다.
과거 우리기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다.
막말로 정부에 잘보이느냐 잘못보이느냐가 생존을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정부 또는 정권과의 관계가 중요시됐다.
정부나 정권과의 관계유지는 최고경영층의 몫이다.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식 경영의 특징중 하나인 "톱-다운(top-down)식 의사결정구조"는
이렇게해서 생겨났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규모 조직과 종적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
남자직원들의 공통분모인 군복무가 어우러져 관료적 조직관리를 부채질했다.
군대식 관료조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최고사령관격인 총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는 군대식
관료조직은 단순모방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데는 더없이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긍정적인 기능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환경이 달라졌다.
우리기업도 이제는 기술이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성장산업이나 태동기
산업에 진출해야한다.
톱-다운식 의사결정 구조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업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없다.
의사결정 단계가 짧고, 분권화되어야한다.
조직도 기능중심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이어서 횡적조정이 가능해야하고
정보가 보텀-업(bottom-up)으로 창출되는 구조라야한다.
유기적 팀조직을 갖추어야한다는 얘기이다.
국내 기업들이 팀제를 도입한 것은 주로 96, 97년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IMF사태가 터진이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팀제를
확대하고있다.
또 팀 재구성에 나서 의사결정이 별로 많지 않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팀은
통합하고있다.
반면 이익을 많이 내거나 의사결정을 더욱 신속하게 해야하는 팀은 분할시켜
권한을 하부로 더 내려 보내는 추세이다.
물론 팀제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팀제가 도입됐지만 종래의 다단계 피라미드식 조직관행이 남아있다.
팀장을 맡지 못한 부장 차장 등 중간간부들은 팀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팀장에게 권한이 충분하게 넘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몰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토요칼럼] 저금의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424728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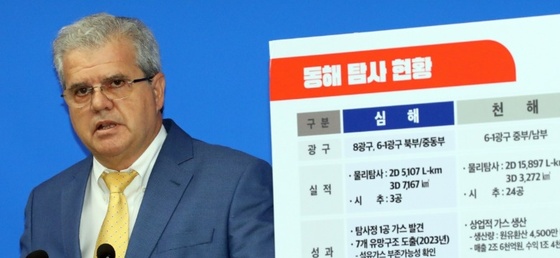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옥수수 가격 반등…에탄올 수요가 견인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59733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