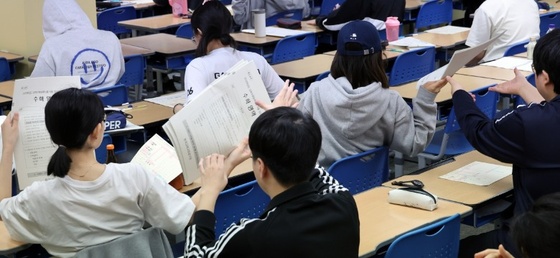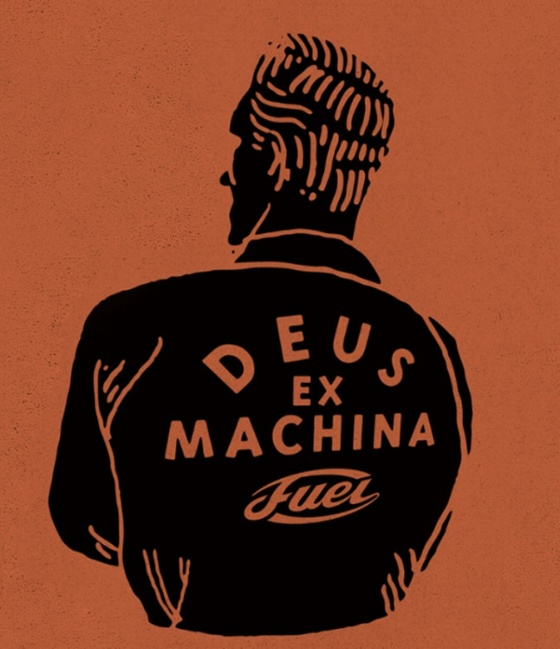[천자칼럼] 초의의 5월
등나무는 비 뒤에 깨끗하고/오랜 돌은 구름속에 고와라//새로 나온 잎은
한창 자라 귀엽고/늘어진 꽃은 시들지 않아 기쁘다//푸른 바위는 수 높은
병풍에 맞먹고/파란 이끼는 비단자리 대신한다//사람 살이에서 무엇을
또 바라랴/턱을 고이고 앉아 돌아가기 잊었는데...."
초의 (1788~1866) 대선사이 "시내에 나가"라는 이 시에서는 속세를
초월한 고결무후한 인품을 읽게 된다.
초의는 선승으로서 불교학은 물론 유학과 도교등의 교학에 통달했고
다도 시서화 범패 원예 장담그기 단방약 등에서도 일가를 이룬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초의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속망을 장의순이라 했다.
15세때 강변에서 놀다가 급류에 휘말려 죽을고비에 이르렀을때 그곳을
지나가던 승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 승려의 권유로 16세때 출가하여 남평 운흥사에서 득도한 뒤
22세때부터 전국의 고승을 찾아다니면서 교와 선을 함께 터득하게 되었다.
그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지자 해남 대웅사의 동쪽 계곡에 암자를 짓고
은둔하여 40여년동안을 수행에 정진했다.
한편 초의는 추사 김정희나 다산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과 교유를
함으로써 불교 이외의 교학과 전통생활문화를 계승 발전시킨 주역이
되었다.
초의의 우뚝한 업적은 선사상과 다선일미 사상에 있다.
선사상은 교와 선의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지관 (산란한 망념을 그치고
정적한 명지로서 모든 법을 관조함)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고승인 백파의 선사상을 비판한 저서 "선문사변만어"에
담겨져 있다.
다선일미사상은 차와 선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다.
수행을 파선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속에서 멋을
찾으면서 불법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조에 들어와 사라져가던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킨 저서
"동다송")에 나오는 것으로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초의의 업적을 기리는 5월이 내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환불 불가 여행상품의 덫](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74328.3.jpg)
![[다산칼럼] '요즘 세대'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변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4470121.3.jpg)
![[데스크 칼럼] 성장률 미궁에 빠진 한은과 Fed](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28010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