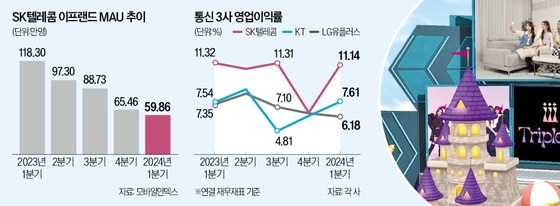[한경칼럼] 부덕의 소치 .. 서기원 <소설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람이란 신성과 마성이 공존하는 동물이다" 또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깨달음에서 싻이 텄을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도 실상 이 생각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수있다.
이르테면 도덕성논쟁을 그만하고 여러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자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고육지책이라 할수 있다.
"푸라톤"은 하인 또는 철인정치를 주장하고 민주제도의 어리석음을 조롱
했다.
동양 특히 중국과 조선에서는 "사람은 어진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인간관을 고집하여
군주에게 무한한 덕과 질명함을 요구해 왔다.
"마귀아벨리"의 "군주론"에도 나오지만 서양사람들은 군주에게 도덕적인
품성보다 능력을 더 중시했다.
헌데 우리의 인간관은 아직도 군주시대의 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선과 도덕성을 요구한다.
일반대중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도덕성의 공허함을 메우고 있다고나
할까.
정치인에겐 "투철한 애국심"과 무한한 봉사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권력욕을 비난한다.
허지만 권력욕이 없는 정치인이란 위선적 포즈가 아니라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대중은 기업인들에게 "국민을 위한" 기업인이 되라고 요구한다.
이윤만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도 한다.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런 도덕적 동기만으로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참 선거후 대통령은 말했다.
"나의 부덕의 소치이다"
왕종시대의 어휘가 등장한 것이다.
아다시피 당시의 국왕은 기상이변이 생겨도 이 말을 썼다.
만사가 군왕의 책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모든 책임에서 면할수도 있는
절묘한 화법인 셈이다.
의무와 책임을 골고루 나눠갖는 것이 민주제도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현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도 사장의 부덕의 수치가
된다.
사람들은 군주제와 민주제가 뒤섞인 비빔밥을 좋아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기고] 녹색해운항로, 국제 해운 탄소중립 실현의 바닷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451233.3.jpg)
![[한경에세이] 세금에 대한 단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29524.3.jpg)


![뉴욕증시 또 사상 최고…AI 베일 벗은 애플은 1.91% 하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1062607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