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경제학] (33) 구축효과 .. 노택선 <청주대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 두 학파간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케인즈학파가 정부의 세입 세출을 통한 재정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을 주장한
반면 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을 주장하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음을 주장했는데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은 지출의 측면에서 볼때 소비지출 투자지출 그리고
정부지출로 구성된다.
이때 소비지출은 대체로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크기에
좌우되고 투자지출은 당시의 이자율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정부지출은 정부가 정책운용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외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얼마일때 국민소득과 전체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자율이 변하면서 투자지출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국민소득이 어떤 수준에 있다고 가정하면 소비지출은 이미 결정되는 것이고
정부지출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소득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하는 국민소득 수준과
시자율의 조합을 여러개 찾아볼수 있는데 이것이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경제학에서는 이들 조합을 그래프상에 표시해서
IS곡선이라고 부른다.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하자.
이렇게되면 소득 보다 지출이 커지게 되고 시중에서 커진 지출만큼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돈값이라고 할수 있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의 투자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지출의 증대가 민간의 투자지출을 몰아내는 이른바 구축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은 다시 예전의 균형수준으로 되돌아 오고 국민소득
에서 차지하는 정부부문의 비중만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투자지출이 이자율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등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몰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609646.3.jpg)
![[토요칼럼] 저금의 재발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424728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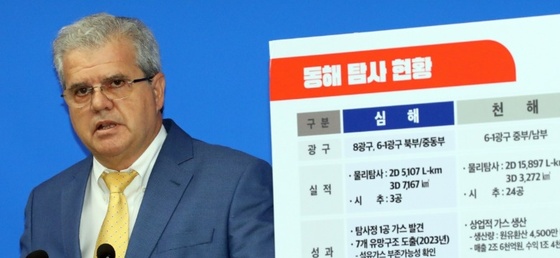

![반나절 만에 3,200억 원 손실…시장 흔든 트레이더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08064644263.jpg)








![[청년이 희망이다] '또다른 인생의 페이지' 꿈꾸는 제주 책방 대표](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7519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