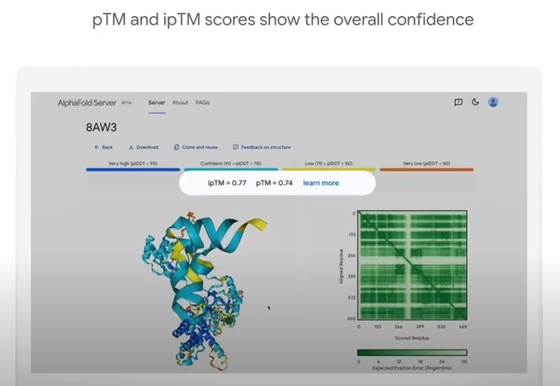[이학영 칼럼] '국민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
상황이 바뀌었거나 잘못 깨달았을 때
신속한 변신은 '무죄'
잘못된 여론과 부딪혔을 때 백년대계 안목 갖고 설득해야
대중에 끌려가면 가짜리더십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
![[이학영 칼럼] '국민이 불안해하는' 진짜 이유](https://img.hankyung.com/photo/201703/01.11998131.1.jpg)
‘표변’을 통해 대성공을 거둔 정치인으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 꼽힌다. ‘노예해방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정치 입문 초기엔 노예제도 옹호론자였다.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더라도 백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살아서는 곤란하며,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요즘 한국 정치판에서 ‘표변’ 논쟁이 뜨겁다. 며칠 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토론회에선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말 바꾸기’ 공방이 치열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체결했는데, 야당이 되자 입장을 뒤집은 건 문제다.”(안희정) “독소 조항 때문에 재협상 요구를 한 것이다.”(문재인) “그 독소조항을 노 대통령 시절에는 고려하지 않았겠나.”(안희정) “국민이 불안해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문재인)
문 후보 말마따나 한·미 FTA 비준을 앞뒀던 2011년, 일부 국민의 불안은 컸다. 불안을 부추기는 ‘괴담’이 들끓은 탓이었다.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창궐한다”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까지 오른다” “물값이 폭등해 빗물을 받아서 쓰게 될 것이다” 등. 실제로 어땠는지는 다들 아는 대로다. 광우병은 없었고, 맹장 수술비는 45만원으로 4만원 오르는 데 그쳤으며, 빗물 얘기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오히려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미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마당이다.
문 후보에게 물어봐야 했던 건 “국민 불안의 진원이었던 괴담들의 진위를 제대로 따져봤는지, 지금도 반대론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었나 싶다. 군중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여론’에 올라타고 눈치를 살피는 건 정치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잘못 알려진 게 있으면 바로잡아 주고,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안목으로 대중을 설득해 나가는 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정치학 용어 가운데, 설익어도 괜찮은 운동가의 ‘신념윤리’와 대비되는 말로 ‘책임윤리’라는 게 있다. 전말(顚末)을 철저하게 파헤쳐 아젠다를 설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정치윤리를 말한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반미(反美)로 뭉쳐있던 핵심 지지계층이 거세게 반발하자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라는 말까지 해가며 정면 돌파했다. ‘책임윤리’를 고뇌하고 실천한 것이다.
FTA뿐만이 아니다. 환경주의자들을 설득하며 제주도 강정에 민군(民軍)복합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결정도 내렸다. 중국이 남중국해 패권욕심을 노골화하며 이어도에까지 시비를 걸어오자,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만으로는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극렬 반대의 선두에 섰다. “주민들이 환경훼손을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국민이 불안해하므로…”에 발목이 잡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궈낸 대역사(大役事)는 대부분 불가능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던 당시, 서울대 상대 교수들이 “농토를 가로질러 소수 부자들의 유람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전원 서명한 반대성명서를 내놓을 정도로 지식인들의 반대가 들끓었다.
정부 내에서도 건설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반대했으니, 야당인 신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건 당연했다. 김대중(DJ)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도 반대의 선봉에 섰다. DJ는 훗날 야당 총재 시절 “그 당시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19대 대선에 출마한다.” 문 후보가 엿새 전 공식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그 말을 믿고 싶다.
이학영 기획조정실장 ha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사람경영, 욕망이 시장이다 [한경에세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560695.3.jpg)
![[한경에세이] 노키즈존 500곳?](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586123.3.jpg)
![[조일훈 칼럼] 왜 멀쩡한 국민을 남의 돈 넘보게 만드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5383340.3.jpg)


![화웨이에 반도체 수출금지 '직격탄'...인텔 2.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90647304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