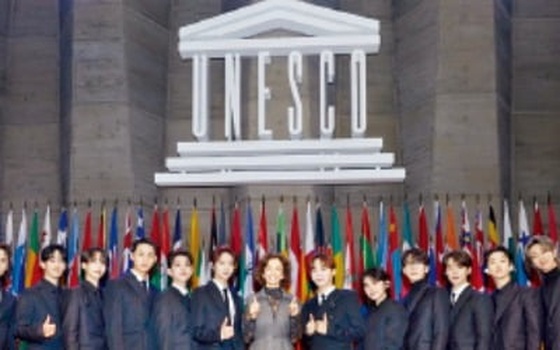[사설] 불황에도 세금이 너무 잘 걷힌다는 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임금 상승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이익률이 높아진 덕분에 호조를 보였다. 비과세·감면 축소 역시 한몫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소비진작책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세수 증가가 경기 호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경기 부양책, 원자재 가격 하락과 같은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세금이 잘 걷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각종 경제 거래가 양성화되고 투명해졌으며, 세원이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호조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1분기 세수는 지난해 하반기의 ‘반짝 경기’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1분기 성장률(0.4%)이 3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근 경기 추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 이후 세수는 장담하기 어렵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집중하고 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도 그래서다. 세수 진도와는 엇박자요 반대 흐름이다. 문제는 대외 여건 변화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기 대책도 그렇지만 세수 전망과 추계도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에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물리고 보자는 식의 선동적 세금 논쟁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