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라이프] "정보 왜곡 우려" 비서실장도 두지 않는 회장, 큰 그림만 그리고 실무 집행 전적으로 맡겨
해외서 답 찾다
매년 수개월 해외 머물며 직접 발품 팔고 현장 검증
2세 경영승계 없다…소유와 경영 분리
투자 전문가가 경영할 것…공평인사 절대 타협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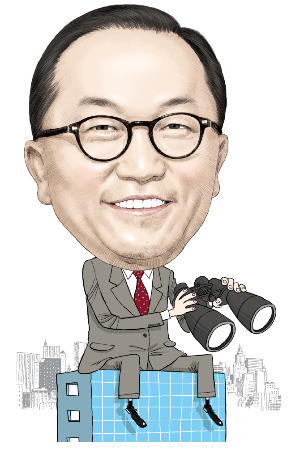
#2.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체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 박 회장이 언제 불쑥 들를지 알 수 없어서다. 박 회장은 동관 36층 집무실에 있다가 예고 없이 직원 사무실을 찾곤 한다. 미래에셋의 한 직원은 “박 회장은 궁금한 게 생기면 실무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며 “워낙 독서량이 많고 현장 경험이 풍부해 무슨 얘기를 해도 금방 이해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비서실 없는 조직…권한 이양
그룹 모태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조직도엔 독특한 점이 있다. 국내 임직원 280여명 중 ‘대표’가 15명에 이른다. 이 회사는 2006년 부문별 대표제도를 도입했다. 예컨대 글로벌 투자부문, 상장지수펀드(ETF) 마케팅부문, 부동산부문 등으로 세분화한 뒤 이를 각 대표가 총괄하는 식이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리테일·트레이딩 등 5개 부문을 각 대표가 관장하도록 했다. 부문대표가 책임과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체제다.
박 회장은 조직 내 분권화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미래에셋의 성장은 현장 중심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조직 측면에서 본사는 더욱 가벼워지고 유연해져야 하며 영업 현장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소통을 유난히 강조한다. 창업 후 한 번도 비서실장을 두지 않은 것도 내부 소통을 위해서다. 비서실장을 통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회장은 2007년 출간한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란 자서전에서 “회장이 전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행 과정에 중점을 두면 사업 부문마다 보신주의가 생겨날 것”이라며 “실무를 결정할 권한을 각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 결재서류엔 회장 사인을 하는 칸이 없다”고 썼다.
박 회장은 전체 경영전략회의를 1년에 몇 차례 하지 않지만 그때조차도 핵심만 토의하고 끝낸다. 회장은 큰 그림을 그리되 부문대표가 알아서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다. 미래에셋의 한 임원은 “한 번 일을 맡긴 사람을 오래 두고 보는 스타일이어서 연말 대규모 인사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직내 분권 강화한 현장 중심의 문화)
아시아 1위 꿈… 해외서 답 찾다
박 회장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공을 들여온 분야는 해외 비즈니스다.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은 국내에선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력인 미래에셋운용이 국내 금융회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해 온 이유다.
미래에셋운용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해외 법인(홍콩)을 설립했다. 현지 운용자산이 5조원 규모로, 중견 운용사가 됐다. 지금까지 인도 브라질 호주 미국 영국 베트남 대만 등 11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 56%가 해외법인 직원으로 구성됐다. 총 63조원의 운용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은 작년 말 기준 36.5%(23조원)다. 이미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목표는 ‘아시아 1위’다. 박 회장은 “아시아의 상품을 갖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미래에셋의 수익 중 50%를 해외에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달 초 2~3개월 일정으로 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직접 발품을 팔면서 현장을 검증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다. 매년 수개월씩 신흥국 등에 머물며 현지 시장을 점검하고 추후 진출할 국가를 미리 살펴본다.
그가 해외 투자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조건은 네 가지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부존자원이 많은 나라, 환경이 좋은 나라다. 이 중 2~4가지 조건을 맞춘 곳을 우선 선택한다. 미래에셋이 진출한 나라도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곳들이다.
미래에셋의 해외 투자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내 왔다. 2006년 2600억원에 인수한 중국 상하이 오피스빌딩(미래에셋타워) 가치는 현재 1조원 정도로 평가된다. 2010년 인수한 브라질 상파울루의 상업용 빌딩도 매입 가격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 1위 골프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 인수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
작년 10월 박 회장의 장녀 하민씨가 미래에셋 홍콩법인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CBRE 등 부동산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그가 우선 미래에셋의 호텔사업을 맡은 뒤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란 추측이 쏟아졌다. 미래에셋 측은 즉각 부인했다. “2세 경영수업이 아니며 단순히 실무 경험을 쌓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자서전에서도 “미래에셋은 처음부터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전문가가 경영하는 회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투자전문그룹인데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97년 미래에셋캐피탈을 창업했을 때부터 박 회장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게 공평 인사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 회장이 경영권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누차 역설했고 자녀들에게도 이를 주지해 왔다”며 “창업 10여년 만에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미래에셋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단독] SK지오도 투자 재조정…1.8조 플라스틱 공장 손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585153.3.jpg)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