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GCF 성공, 한국 리더십에 달렸다
재원 조성·배분에 합의 이끄는 등
기후재원 논의 주도권 선점하길"
조홍식 <서울대 환경법학 교수>
![[시론] GCF 성공, 한국 리더십에 달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AA.8128267.1.jpg)
하지만 GCF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과거 지구환경금융(GEF)이나 적응기금(AF) 사례처럼 새로운 국제기구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GCF의 초기 재원 조성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선진국은 2010년 ‘칸쿤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조성해 개도국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선진국이 지금까지 내놓은 재원은 사무국 운영비 690만달러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에 끝난 바르샤바 기후변화회의에서도 GCF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GCF 초기 재원이 ‘상당한 규모’여야 함을 강조하고 내년 말 열리는 총회 전까지 초기 재원 조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독일, 노르웨이, 영국 등은 향후 재원 공여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GCF의 재원이 실제 조성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GCF의 성패는 기금 규모의 극대화에 달려 있는데 이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합의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협상에서 GCF 유치국의 지위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해 두 진영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야 한다. 그래야만 GCF 사무국 출범이 단순히 서비스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컨벤션 효과’를 넘어 송도를 ‘세계 녹색금융의 허브’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8월 국회의 협조 아래 GCF와 본부협정을 체결하고 ‘GCF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GCF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천시와 함께 GCF 사무국의 출범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공간과 운영자금 등 유·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GCF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사업모델에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을 극복할 수 없다. GCF 이사회는 GCF 전체 및 사무국의 조직 구조에 대한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종종 형식보다는 실제가 우선한다. GCF 사무국이 초기에 무슨 권한을 부여받았는가보다는 이후에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사무국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항은 두 진영의 합의가 요원한 재원조성 및 재원배분과 같은 핵심 운영체제이다. 기금의 규모와 모금 방식, 기금신청이 가능한 국가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기금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GCF의 목표 재원과 선진국의 공여 재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민간 부문의 재원으로 보충하는 사업모델도 고안해내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두 진영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발전 모델과 이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연구·개발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녹색기술센터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GCF 사무국 출범이 한국에서 기후재원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조홍식 <서울대 환경법학 교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포토] 이스라엘군, 라파 도심서 시가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867330.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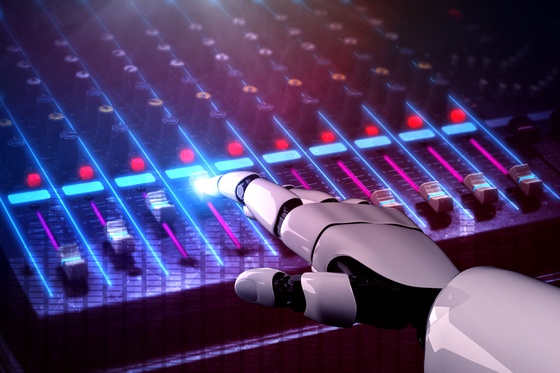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