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LED가 답이다] 美·日 보조금 주며 LED 보급…한국은 목표뿐, 액션플랜 '깜깜'
민간보급 위해 하는 일은 5년간 1000억원 지원뿐
품질인증 미흡해 저가 중국산 범람…소비자 불신
![['전력대란' LED가 답이다] 美·日 보조금 주며 LED 보급…한국은 목표뿐, 액션플랜 '깜깜'](https://img.hankyung.com/photo/201307/AA.7700026.1.jpg)
한국의 LED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09년 세계 최초로 LED TV를 상용화했고 2010년엔 세계 2위 LED소자 생산국이 됐다. 하지만 LED 조명 보급률로 보면 한국은 후진국이다. 일본의 8분의 1,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LED업계는 보급률 목표만 높이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을 원인으로 꼽는다. 발표된 정책마저도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게 대부분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정부가 산업표준을 정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LED 보급을 확대해왔다.
◆실효성 있는 보급 정책 없어
조명은 국내 전력 사용량의 17.3%(2010년 기준)를 소비하는 분야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열전구가 LED로 대체되면 연간 1800GWh 이상의 전력이 절감된다. 50만~65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공공분야의 LED 조명 보급률은 상승세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률(교육기관 제외)은 약 26%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민간부문이다. 업계는 민간부문 LED 조명 보급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간부문에서 확산이 더딘 것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민간 보급을 위해 하는 일은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 공간을 넓히고 저소득층, 양계농가, 소상공인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2011~2015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정도다. ‘LED 조명 2060 계획’에서 정부 자금 투입보다는 민간 건물·주택에 고효율 조명을 의무사용토록 해 LED 조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천은 지지부진하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부회장은 “LED 조명 보급률은 미미한데 그마저도 공공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LED 선진국은 다르다. LED 조명을 사는 기업과 소비자에 상당액을 돌려주는 실질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쳐 소비를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와 전력회사마다 727개의 조명 관련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조명을 설치한 뒤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부 금액을 되돌려준다. 보조금 규모도 제품별로 램프당 5~20달러로 다양하다.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건물의 에너지 절감 기준을 정해놓고 ‘에코포인트 플러스’라는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야기, 사이타마 등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설비 도입 비용을 최대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대준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아파트를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조명을 LED로 하면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 기준은 없고, 진입 규제만
정부는 LED 조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시장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실패한 상태다.
60W 백열전구를 대체하려면 어떤 LED 전구를 사야 하는지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고효율기준(KC) 외에 다른 표준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위해선 이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업체가 외면한다. 기존 한국산업표준(KS)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이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의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서다. 이렇다보니 인증이 유명무실해지고 저품질, 저가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싸구려 LED 조명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밝기가 덜하고 수명도 짧은 것을 경험한 뒤 LED 조명에 등을 돌린다.
미국은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개발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으로 품질을 가린다. 인증 과정도 신속하게 진행돼 2~3주 안에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에너지스타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각종 세금 혜택과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또 ‘캘리퍼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변별력을 높여준다. 에너지부가 시판 중인 LED 조명 제품을 시험해 평가한 뒤 이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LED 조명 중 필요한 제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도 운영한다. 제조사들이 자체 성능 시험을 시행해 광량, 소비전력, 광효율과 색온도 등을 등록하게 한 뒤 이 같은 라벨을 제품에 붙이도록 한다.
시장과 업계가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부는 정기적으로 LED 조명업계 관계자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주최한다. ‘녹색’ 등 정부 정책 홍보에만 급급한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에너지부는 LED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미국 업체를 키워 세계 LED 조명 시장의 50%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다. LED 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한국과 차이가 크다. 국내 대기업들은 현재 LED 조명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등기구 시장 진입이 막혔고, 램프도 백열전구와 할로겐 조명 대체용인 제품 3종만 판매할 수 있다.
LED업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는 보급을 위한 표준화 인증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짜고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LED업계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 에너지부의 체계적인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현/김현석 기자 hi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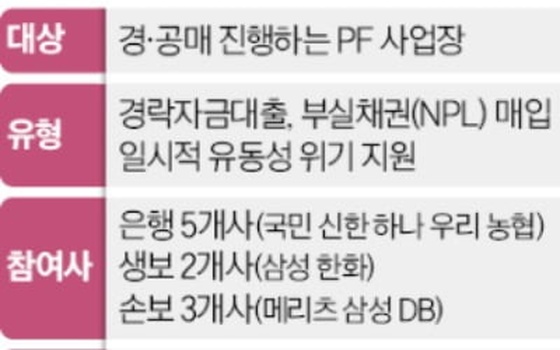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311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