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빛내리 교수 "세포의 운명 이해하면 癌도 해결되겠죠"
마이크로RNA 1인자…"가장 노벨상에 근접" 평가
"결혼·출산이 연구인생 고비…연구비 없어 억대 빚지기도"

김 교수가 이 분야를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RNA는 유전물질인 DNA가 자체 유전정보를 이용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자 정도로만 여겨졌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마이크로RNA 생성 과정 밝혀
김 교수는 마이크로RNA 분야의 자타공인 1인자다. 마이크로RNA는 세포 안에 존재하는 띠 모양의 염기 사슬로 세포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를 조절해 세포 분화와 성장, 죽음에 관여한다. 그는 이 마이크로RNA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밝혀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올랐다. 김 교수는 “마이크로RNA가 생성되는 중간 단계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RNA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규명했고, 이를 담당하는 효소인 ‘드로셔’와 ‘다이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분화와 암 발생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RNA인 ‘렛 세븐(let-7)’ 생성 과정에서 ‘텃(TUT)’이라는 단백질의 역할을 밝혀냈다. 텃 단백질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셈이다. 김 교수는 “지금은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비 없어 억대 빚 쌓이기도
이제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김 교수지만 연구 인생에 고비도 있었다. 가장 큰 것은 ‘결혼과 출산’이었다. 김 교수는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칠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집에서 1년6개월간 쉬었다”며 “당시 실력 있는 여자 선배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걸 보고 ‘저 선배들도 안 되는 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연구를 그만두려 했다”고 말했다. 쉬면서 남편의 권유로 1주일간 사법고시 공부도 했을 정도였다. 그는 “아무리 실력이 좋은 과학기술인이라도 정규직을 얻는 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며 “결국 가족들의 도움으로 다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시작하고서도 불안한 게 많았다. “연구를 막 시작했던 2001년만 하더라도 RNA 관련 국내외 연구 성과가 전무했기 때문에 ‘혹시나 실패할 프로젝트는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걱정했던 적이 많았다”고 했다. 연구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때도 있었다. 김 교수는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해 나중엔 장비나 연구물품 업체에 결제를 못 해줘 억원대의 빚이 쌓였다”고 말했다.
◆“세포 운명 연구할 것”
과학자로서 풀고자 하는 핵심 문제에 대해 묻자 그는 “세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탐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어떤 세포는 신경세포가, 다른 세포는 근육세포가 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해답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세포의 운명을 이해하게 되면 암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특히 RNA가 세포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과학계에 쓴소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가장 창의적이어야 할 과학계에 아직도 교수와 학생, 연구원 내 학생 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특유의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교수도 틀린 소리를 할 때가 많은데 이런 문화 탓에 학생들이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면 연구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연구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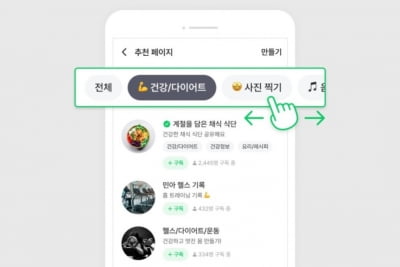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