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다] 4년제 대학 121 → 202개 '우후죽순'
1993년 이후 설립요건 완화
외형경쟁에 교육의 질 저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준칙주의’를 도입했다. 명분은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대학 간 경쟁 유도였다.
정치인들은 지역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다퉈 대학 유치에 나섰다. 지역의 자산가들 역시 대학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대학은 세 정부를 거치면서 15년 후인 2003년 199개로 급증했다.
지난해와 올해 폐교 명령 또는 퇴출 절차를 통보받은 대학들은 모두 대학설립 요건이 완화된 이후 생긴 곳이다. 1997년 개교한 성화대와 명신대(1999년), 선교청대(2003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기간에 대학이 급증하면서 대학 간 외형 불리기 경쟁도 벌어졌다. 일단 번듯한 건물을 지어야 신입생 유치가 잘된다는 속설 때문인지 캠퍼스마다 최신식 건물이 줄지어 들어섰다. 하지만 자산을 외형 꾸미기에 소진한 탓에 연구와 교육의 질은 높이지 못했다.
대학 수는 너무 많고 고교 졸업생은 저출산 여파로 급감해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 수가 전체 대학 입학 정원(59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부실 대학 정리에 나선 것이 때늦은 조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국립대에는 학과 통·폐합 등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수년 내에 특성화가 잘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차이가 현격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대학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뜨겁다고 하지 않겠다"…CPI 앞두고 사상 최고가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201074733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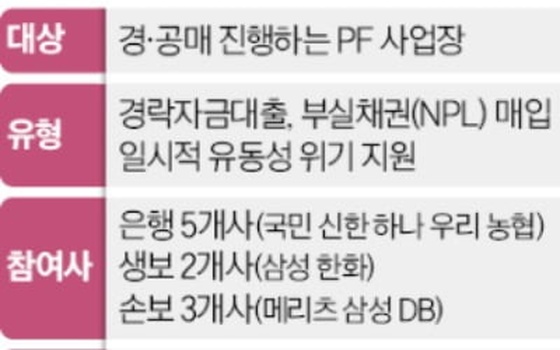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출격](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2134.1.jpg)


![[단독] "1억이 7억 된다" 달콤한 유혹…교수도 넋놓고 당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00558.3.jpg)


![[이 아침의 안무가] 발레에 소소한 일상 담은 안무가, 케네스 맥밀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23119.3.jpg)